м„ң лЎ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bronchoalveolar lavage)мқҖ кё°кҙҖм§ҖкІҪмқ„ нҶөн•ҙ нҸҗмқҳ м„ёмІҷм•Ўмқ„ нҡҢмҲҳн•ҳм—¬ нҸҗ лӮҙл¶Җмқҳ мғҒнғңлҘј 진лӢЁн•ҳлҠ” кІҖмӮ¬ л°©лІ•мқҙлӢӨ. нҸҗнҸ¬мҷҖ кё°кҙҖм§Җмқҳ м„ёнҸ¬ л°Ҹ лҜёмғқл¬ј мғҒнғңлҘј м§Ғм ‘м ҒмңјлЎң нҸүк°Җн• мҲҳ мһҲм–ҙ к°җм—јм„ұ м§Ҳнҷҳ, к°„м§Ҳм„ұ нҸҗ м§Ҳнҷҳ л“ұ лӢӨм–‘н•ң нҸҗ м§Ҳнҷҳмқҳ 진лӢЁм—җ л„җлҰ¬ мӮ¬мҡ©лҗңлӢӨ. лҳҗ мқјл¶Җ м§Ҳнҷҳм—җм„ңлҠ” м№ҳлЈҢм Ғ лӘ©м ҒмңјлЎ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Ӯ¬мҡ©н•ҳкё°лҸ„ н•ңлӢӨ. кё°кҙ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Җ нҸҗнҸ¬лӮҙ нҷҳкІҪкіј кҙҖл Ёлҗң кІҖмІҙлҘј нҡҚл“қн• мҲҳ мһҲлҠ” кІҖмӮ¬лЎң лӢӨм–‘н•ң нҸҗ м§Ҳнҷҳмқҳ м—°кө¬лҘј мң„н•ҙм„ңлҸ„ мӢңн–үлҗҳкі мһҲлӢӨ.
ліё мў…м„Өм—җм„ңлҠ”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л°ңм „ кіјм • л°Ҹ кө¬мІҙм Ғмқё кІҖмӮ¬ л°©лІ•мқ„ мӮҙнҺҙліҙкі мһ„мғҒм—җм„ң нҷңмҡ©лҸ„м—җ лҢҖн•ҳм—¬ м •лҰ¬н•ҳкі мһҗ н•ңлӢӨ. лҳҗ мөңк·ј мқјл¶Җ нҸҗ м§Ҳнҷҳ м—°кө¬м—җм„ң кё°кҙ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ҙ нҷңмҡ©лҗҳкі мһҲмқҢмқ„ ліҙмқҙкі мһҗ н•ңлӢӨ.
ліё лЎ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м—ӯмӮ¬ л°Ҹ л°ңм „
1927л…„ кІҪм§Ғм„ұ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rigid bronchoscope)мқ„ нҶөн•ҙ кё°кҙҖм§Җ лӮҙм—җ мӢқм—јмҲҳлҘј мЈјмһ…н•ҳм—¬ м„ёмІҷн•ң кІғмқҙ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мӢңмҙҲлЎң 여겨진лӢӨ[1]. 1966л…„м—җлҠ” Ikedaк°Җ көҙкіЎкё°кҙҖм§ҖкІҪ(flexible bronchoscope)мқ„ к°ңл°ңн•ҳмҳҖкі көҙкіЎкё°кҙҖм§ҖкІҪмқҖ кІҪм§Ғм„ұ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ліҙлӢӨ мӮ¬мҡ©мқҙ мҡ©мқҙн•ҳм—¬ лӮҙкіј мҳҒм—ӯм—җм„ң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мқ„ л„җлҰ¬ мӮ¬мҡ©н•ҳлҠ” кі„кё°к°Җ лҗҳм—ҲлӢӨ[2]. нҳ„мһ¬ мһ„мғҒм—җм„ң л§Һмқҙ нҷңмҡ©лҗҳлҠ” нҳ•нғңмқҳ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Җ 1974л…„ ReynoldsмҷҖ Newballм—җ мқҳн•ҙ мӢңмһ‘лҗҳм—ҲлҠ”лҚ°[3] мқҙл“ӨмқҖ көҙкіЎкё°кҙҖм§ҖкІҪмқ„ мӮ¬мҡ©н•ҳм—¬ нҸҗмқҳ нҠ№м • л¶Җмң„лҘј мғқлҰ¬м Ғ мӢқм—јмҲҳлЎң м„ёмІҷн•ҳлҠ” л°©лІ•мқ„ м ңмӢңн•ҳмҳҖлӢӨ[2-4]. мқҙн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қҙмҡ©н•ң м—°кө¬к°Җ нҷңл°ңн•ҳкІҢ 진н–үлҗҳм—Ҳмңјл©° 1990л…„лҢҖм—җлҠ” мң лҹҪнҳёнқЎкё°н•ҷнҡҢ(European Respiratory Society) л°Ҹ лҜёкөӯнқүл¶Җн•ҷнҡҢ(American Thoracic Society)м—җм„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кё°мҲ м Ғ мёЎл©ҙ л°Ҹ к°„м§Ҳм„ұ нҸҗ м§Ҳнҷҳм—җм„ңмқҳ нҷңмҡ© л“ұмқ„ м •лҰҪн•ҳмҳҖлӢӨ[4]. мқҙн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нҷңмҡ©мқҖ л„җлҰ¬ нҷ•лҢҖлҗҳм—Ҳмңјл©° нҳ„мһ¬ нҳёнқЎкё° м§Ҳнҷҳмқҳ 진лӢЁ, м№ҳлЈҢ л°Ҹ м—°кө¬ л“ұм—җм„ң лӢӨм–‘н•ң л°©л©ҙмңјлЎң мӨ‘мҡ”н•ҳкІҢ нҷңмҡ©лҗҳкі мһҲлӢӨ.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ҖмӮ¬мқҳ л°©лІ•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Ӣңн–үн•ҳкё° мң„н•ҙм„ңлҠ” кІҖмӮ¬ м „ мӨҖ비к°Җ н•„мҡ”н•ҳлӢӨ. лЁјм Җ нҷҳмһҗмқҳ лі‘л Ҙкіј м•Ңл ҲлҘҙкё° мқҙл Ҙмқ„ нҷ•мқён•ҳкі нҳҲм•Ў мқ‘кі кІҖмӮ¬ л“ұ кё°ліём Ғмқё кІҖмӮ¬лҘј мӢӨмӢңн•ҳм—¬ м¶ңнҳҲ мң„н—ҳмқ„ нҸүк°Җн•ңлӢӨ.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мқ„ мқҙмҡ©н•ң кІҖмӮ¬ м Ҳм°Ём—җ лҢҖн•ҳм—¬ нҷҳмһҗм—җкІҢ м„ӨлӘ…мқҙ н•„мҡ”н•ҳл©° лҸҷмқҳлҘј м–»м–ҙм•ј н•ңлӢӨ.
кІҖмӮ¬ м „ кёҲмӢқ мӢңк°„м—җ лҢҖн•ҙм„ңлҠ” лӘ…нҷ•н•ң н•©мқҳк°Җ мқҙлЈЁм–ҙм ё мһҲм§ҖлҠ” м•ҠмңјлӮҳ көӯлӮҙм—җм„ңлҠ” 6-8мӢңк°„мқҳ кёҲмӢқ мӢңк°„мқ„ м§ҖнӮӨкі мһҲлӢӨ[2]. лӢӨл§Ң мқјл¶Җ м§Җм№Ём—җм„ңлҠ” кі нҳ•мӢқмқҖ м„ӯм·Ё нӣ„ 4мӢңк°„, 맑мқҖ мң лҸҷмӢқмқҖ м„ӯм·Ё нӣ„ 2мӢңк°„ кІҪкіј нӣ„ кІҖмӮ¬лҘј 진н–үн•ҳм—¬лҸ„ нқЎмқёмқҳ мң„н—ҳмқҙ мҰқк°Җн•ҳм§Җ м•ҠлҠ”лӢӨкі м ңмӢңн•ҳкі мһҲлӢӨ[5].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мқҖ мҪ”лӮҳ мһ…мқ„ нҶөн•ҙ мӮҪмһ…лҗҳл©° кё°кҙҖм§ҖлҘј л”°лқј н•ҳл¶Җ кё°лҸ„к№Ңм§Җ 진мһ…н•ңлӢӨ. мқҙ кіјм •мқҖ нҷҳмһҗмқҳ л¶ҲнҺёк°җ л°Ҹ кё°м№Ёмқ„ мң л°ңн•ҳлҜҖлЎң көӯмҶҢ л§Ҳм·Ёк°Җ н•„мҡ”н•ҳлӢӨ. лҰ¬лҸ„м№ҙмқёмқ„ лҸ„нҸ¬н•ҳлҠ” л°©лІ•мқҙ к°ҖмһҘ л§Һмқҙ мӮ¬мҡ©лҗңлӢӨ. лҰ¬лҸ„м№ҙмқёмқҖ лҸ…м„ұмқҙ м Ғкі мһ‘мҡ© мӢңк°„мқҙ 짧мқҖ мһҘм җмқҙ мһҲлӢӨ. кІҖмӮ¬ м „ лҰ¬лҸ„м№ҙмқём•Ўкіј л„Өлё”лқјмқҙм ҖлҘј мӮ¬мҡ©н•ҳм—¬ 비강, кө¬к°•м—җ лҸ„нҸ¬н•ҳл©°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мӮҪмһ… нӣ„м—җлҠ” лӮҙмӢңкІҪмқҳ мұ„л„җмқ„ нҶөн•ҙ лқјлҸ„м№ҙмқём•Ўмқ„ мЈјмһ…н•ҳм—¬ көӯмҶҢ лҸ„нҸ¬лҘј н•ҳкІҢ лҗңлӢӨ. м№ҳлЈҢм Ғ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нҳ№мқҖ кІҪм§Ғм„ұ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мӢңн–ү мӢң м „мӢ л§Ҳм·Ёк°Җ н•„мҡ”н•ң кІҪмҡ°к°Җ мһҲмңјлӮҳ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ң„н•ҙм„ңлҠ” көӯмҶҢ л§Ҳм·Ёл§ҢмңјлЎң мӢңмҲ мқҳ 진н–үмқҙ к°ҖлҠҘн•ҳлӢӨ.
нҷҳмһҗмқҳ л§ҢмЎұлҸ„ н–ҘмғҒ л°Ҹ мӢңмҲ мқ„ лҚ” мҡ©мқҙн•ҳкІҢ мҲҳн–үн• мҲҳ мһҲлҸ„лЎқ л§ҺмқҖ кІҪмҡ° 추к°Җм ҒмңјлЎң м§„м • м•Ҫл¬јмқ„ мӮ¬мҡ©н•ңлӢӨ.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кІҖмӮ¬ мӢңм—җлҠ”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분лҘҳмғҒ мӨ‘мҰқлҸ„ м§„м •мқ„ лӘ©н‘ңлЎң н•ңлӢӨ. мӮ¬мҡ©н•ҳлҠ” м•Ҫл¬јлЎңлҠ” лҜёлӢӨмЎёлһҢ(midazolam), нҺңнғҖлӢҗ(fentanyl), н”„лЎңнҸ¬нҸҙ(propofol), лҚұмҠӨл©”л””нҶ лҜёл”ҳ(dexmedetomidine) л°Ҹ мјҖнғҖлҜј(ketamine) л“ұмқҙ мһҲлӢӨ. мөңк·јм—җлҠ” л ҲлҜёл§ҲмЎёлһҢ(remimazolam)мқҙ лҜёлӢӨмЎёлһҢмқҙлӮҳ мң„м•Ҫм—җ 비н•ҙ м ңн•ңлҗң мӢңк°„ лӮҙ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кІҖмӮ¬мқҳ м„ұкіөлҘ мқ„ лҶ’мқј мҲҳ мһҲмңјл©° м•Ҳм „н•ҳлӢӨлҠ” м—°кө¬ кІ°кіјк°Җ ліҙкі лҗҳл©ҙм„ң[6] мқјл¶Җ мӢңмҲ мһҗл“ӨмқҖ мӢңмҲ мӢң л ҲлҜёл§ҲмЎёлһҢмқ„ м„ нғқн•ҳкі мһҲлӢӨ.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Җ кё°кҙҖм§Җм„ёмІҷ(bronchial washing)кіј кө¬л¶„лҗҳлҠ” лӢӨлҘё кІҖмӮ¬мқҙлӢӨ. кё°кҙҖм§Җм„ёмІҷмқҖ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кІҖмӮ¬ мӢ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ліҙлӢӨ мүҪкі л№ лҘҙкІҢ мӢңн–үн• мҲҳ мһҲмңјлӮҳ мғҒкё°лҸ„мқҳ 분비물м—җ мқҳн•ҳм—¬ мҳӨм—јмқҙ л°ңмғқн• мҲҳ мһҲмңјл©° м„ёкё°кҙҖм§ҖлӮҳ нҸҗнҸ¬мқҳ мғҒнғңлҘј м •нҷ•нһҲ л°ҳмҳҒн•ҳм§Җ лӘ»н•ңлӢӨлҠ” м җм—җм„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ј м°Ёмқҙк°Җ мһҲлӢӨ.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Ӣңн–ү мӢңм—җлҠ” н‘ңм Ғмқҙ лҗҳлҠ” кө¬м—ӯкё°кҙҖм§Җ(segmental bronchus) нҳ№мқҖ кө¬м—ӯкё°кҙҖм§Җк°Җм§Җ(subsegmental bronchus)м—җ лӮҙмӢңкІҪмқ„ лҒјмӣҢ л„Јкі н•ҙлӢ№ л¶Җмң„лҘј мҷёл¶ҖмҷҖ лӢЁм ҲмӢңнӮЁ мғҒнғңм—җ мғқлҰ¬м Ғ мӢқм—јмҲҳ 100-300 mLлҘј 3-5нҡҢ лӮҳлҲ„м–ҙ мЈјмһ…н•ҳл©° мЈјмһ… нӣ„ м„ёмІҷм•Ўмқ„ лӢӨмӢң нҡҢмҲҳн•ҳм—¬ кІҖмІҙлЎң мӮ¬мҡ©н•ңлӢӨ. кё°кҙҖм§Җм„ёмІҷмқҳ кІҪмҡ° нҠ№м • кө¬м—ӯм—җ лӮҙмӢңкІҪмқ„ мҗҗкё°мӢңнӮӨм§Җ м•Ҡмңјл©° 분м§Җлҗҳкё° мқҙм „мқҳ кё°кҙҖм§Җм—җм„ң 10-20 mLмқҳ мғқлҰ¬м Ғ мӢқм—јмҲҳлҘј мЈјмһ…н–ҲлӢӨк°Җ лӢӨмӢң нқЎмһ…н•ҳм—¬ кІҖмІҙ мҡ©кё°м—җ мҲҳ집н•ңлӢӨ.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Ӣңн–үн•ҳлҠ” мң„м№ҳлҠ” м»ҙн“Ён„°лӢЁмёөмҙ¬мҳҒ мҳҒмғҒм—җм„ң лі‘ліҖмқҙ лҡңл ·н•ҳкІҢ кҙҖм°°лҗҳлҠ” л¶Җмң„лЎң м„ нғқн•ңлӢӨ[5]. лі‘ліҖмқҳ 분нҸ¬к°Җ л„“кІҢ нҚјм ё мһҲкұ°лӮҳ нҠ№м • кө¬м—ӯмңјлЎң көӯн•ңн•ҳкё° м–ҙл Өмҡҙ кІҪмҡ° мҡ°мӨ‘м—Ҫ(right middle lobe)кіј мўҢмғҒм—Ҫ(left upper lobe)мқҳ нҳҖкө¬м—ӯ(lingular segments)мқҙ м„ нҳёлҗңлӢӨ. мқҙ мң„м№ҳлҠ” м ‘к·јм„ұмқҙ мўӢмңјл©° лҲ„мҡҙ мһҗм„ём—җм„ң 충분н•ң м–‘мқҳ кІҖмІҙлҘј м–»кё° мўӢкё° л•Ңл¬ёмқҙлӢӨ. н•ҳм§Җл§Ң мғҒнҷ©м—җ л”°лқј м ‘к·јмқҙ м–ҙл өкұ°лӮҳ мӨ‘л Ҙм—җ л°ҳн•ҳм—¬ кІҖмІҙлҘј нҡҢмҲҳн•ҳм—¬м•ј лҗҳлҠ” кө¬м—ӯмқ„ л°ҳл“ңмӢң м„ нғқн•ҙм•ј н•ҳлҠ” мғҒнҷ©лҸ„ мһҲмқ„ мҲҳ мһҲлҠ”лҚ° мқҙлҹ¬н•ң кІҪмҡ° м Ғм •лҹүмқҳ кІҖмІҙлҘј нҡҢмҲҳн•ҳкё° мң„н•ҳм—¬ нҷҳмһҗмқҳ лҲ„мҡҙ мһҗм„ёлҘј ліҖкІҪн•ҳм—¬ кІҖмӮ¬лҘј 진н–үн•ҳкё°лҸ„ н•ңлӢӨ[2].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мң мҡ©м„ұ
к°җм—јм„ұ м§Ҳнҷҳ
нҸҗл ҙ л“ұ к°җм—јм„ұ нҸҗ м§Ҳнҷҳмқҙ мқҳмӢ¬лҗҳлҠ” кІҪмҡ° мӣҗмқё лҜёмғқл¬ј нҷ•мқёмқ„ мң„н•ҳм—¬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Ӣңн–үн• мҲҳ мһҲлӢӨ. нӣ„мІңм„ұл©ҙм—ӯкІ°н•ҚмҰқ(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нҷҳмһҗ, мһҘкё°к°„ мҠӨн…ҢлЎңмқҙл“ңлҘј мӮ¬мҡ©н•ң нҷҳмһҗ, н•ӯм•” м№ҳлЈҢ нҷҳмһҗ, мһҘкё° мқҙмӢқ нҷҳмһҗ л“ұ л©ҙм—ӯмқҙ м–өм ңлҗҳм–ҙ мһҲлҠ” нҷҳмһҗм—җм„ңлҠ” кё°нҡҢ к°җм—јмқ„ к°җлі„н•ҙм•ј н•ҳлҜҖлЎ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ҙ лҚ”мҡұ мӨ‘мҡ”н•ң м—ӯн• мқ„ н•ңлӢӨ[5]. мқјл°ҳм ҒмңјлЎң м–»мқҖ кІҖмІҙлҘј нҶөн•ҙ лҜёмғқл¬ј л°°м–‘ кІҖмӮ¬ л°Ҹ мӨ‘н•©нҡЁмҶҢм—°мҮ„л°ҳмқ‘(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кІҖмӮ¬лҘј мӢңн–үн•ңлӢӨ.
нҠ№нһҲ л©ҙм—ӯм–өм ңмһҗм—җм„ң мӨ‘мҰқ нҸҗл ҙмқ„ мһҗмЈј мқјмңјнӮӨлҠ” нҸҗнҸ¬мһҗ충нҸҗл ҙмқҳ 진лӢЁ мӢ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ҖмІҙлҘј нҷңмҡ©н•ң PCR кІҖмӮ¬мқҳ 진лӢЁм Ғ м •нҷ•лҸ„к°Җ л§Өмҡ° лҶ’мқҖ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6]. 1994л…„л¶Җн„° 2012л…„к№Ңм§Җ м¶ңнҢҗлҗң 16к°ңмқҳ л…јл¬ёмқ„ л©”нғҖ 분м„қн•ң м—°кө¬м—җм„ңлҠ”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м—җм„ң нҸҗнҸ¬мһҗ충 PCRмқҳ лҜјк°җлҸ„лҠ” 98.3% (95% мӢ лў° кө¬к°„, 91.3-99.7), нҠ№мқҙлҸ„лҠ” 91.0% (95% мӢ лў°кө¬к°„, 82.7-95.5)лЎң ліҙкі лҗҳм—ҲлӢӨ[7].
мөңк·јм—җлҠ”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мқ„ нҶөн•ҙ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MALDI-TOF) л°Ҹ PCRкіј н•Ёк»ҳ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PCR/ESI-MS)к°Җ мӢңн–үлҗҳкі мһҲлӢӨ[1].
к°„м§Ҳм„ұ нҸҗ м§Ҳнҷҳ
к°„м§Ҳм„ұ нҸҗ м§Ҳнҷҳмқҳ 진лӢЁм—җм„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нҶөн•ҙ м–»лҠ” кІҖмІҙм—җм„ң л°ұнҳҲкө¬ 분мңЁ кІҖмӮ¬лҘј нҶөн•ҙ нҸҗнҸ¬лҢҖмӢқм„ёнҸ¬(macrophage), лҰјн”„кө¬(lymphocyte), нҳёмӨ‘кө¬(neutrophil) л°Ҹ нҳёмӮ°кө¬(eosinophil)мқҳ 분мңЁмқ„ нҷ•мқён•ҳлҠ” кІғмқҙ лҸ„мӣҖмқҙ лҗ мҲҳ мһҲлӢӨ. м •мғҒмқём—җм„ң л°ұнҳҲкө¬ 분мңЁмқҖ нҸҗнҸ¬лҢҖмӢқм„ёнҸ¬ 80-90%, лҰјн”„кө¬ 5-15%, нҳёмӨ‘кө¬ 3% мқҙн•ҳ, нҳёмӮ°кө¬ 1% лҜёл§Ң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4]. лҜёмғқл¬ј кІҖмӮ¬ л°Ҹ лі‘лҰ¬н•ҷм Ғ кІҖмӮ¬лҘј мӢңн–үн•ҳл©ҙ лі‘мӣҗк· л°Ҹ м•”м„ёнҸ¬ мң л¬ҙ л“ұмқ„ нҷ•мқён•ҳм—¬ лӢӨлҘё нҸҗ м§Ҳнҷҳкіј к°җлі„ 진лӢЁмқ„ н• мҲҳ мһҲлӢӨ.
к°„м§Ҳм„ұ нҸҗ м§Ҳнҷҳ мӨ‘м—җм„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нҶөн•ҙ 진лӢЁм Ғ лҸ„мӣҖмқ„ м–»мқ„ мҲҳ мһҲлҠ” лҢҖн‘ңм Ғмқё м§ҲнҷҳмңјлЎңлҠ” кіјлҜјм„ұ нҸҗл ҙ(hypersensitivity pneumonitis), мң мңЎмў…мҰқ(sarcoidosis), нҠ№л°ңм„ұ кё°м§Ҳнҷ” нҸҗл ҙ(cryptogenic organzing pneumonia) л“ұмқҙ мһҲлӢӨ. мқҙ м§Ҳнҷҳл“Өм—җм„ңлҠ” лҰјн”„кө¬к°Җ мЈјлЎң мҰқк°Җн•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8]. нҠ№л°ңм„ұ нҸҗ섬мң мҰқ(idiopathic pulmonary fibrosis)м—җм„ңлҠ” мЈјлЎң мӨ‘м„ұкө¬к°Җ мҰқк°Җлҗҳм–ҙ мһҲлӢӨ(Table 1).
кіјлҜјм„ұ нҸҗл ҙ, нҠ№нһҲ 비섬мң м„ұ кіјлҜјм„ұ нҸҗл ҙ(nonfibrotic hypersensitivity pneumonitis)мқҙ мқҳмӢ¬лҗҳлҠ” кІҪмҡ°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 лҰјн”„кө¬ мҲҳ 분м„қмқҳ мӢңн–үмқҙ к¶Ңкі лҗҳл©° 섬мң м„ұ кіјлҜјм„ұ нҸҗл ҙ(fibrotic hypersensitivity pneumonitis)мқҙ мқҳмӢ¬лҗҳлҠ” кІҪмҡ°м—җлҸ„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Ӣңн–үн•ҳм—¬ ліј мҲҳ мһҲлӢӨ[8]. 비섬мң м„ұ кіјлҜјм„ұ нҸҗл ҙмқҖ лҰјн”„кө¬мҰқк°ҖмҰқкіј м—°кҙҖлҗҳм–ҙ мһҲмңјл©° к·ё 비мңЁмқҙ 20-40%к№Ңм§Җ мғҒмҠ№н•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 лҰјн”„кө¬мҰқк°ҖмҰқмқҙ кҙҖм°°лҗҳм§Җ м•ҠлҠ”лӢӨл©ҙ 비섬мң м„ұ кіјлҜјм„ұ нҸҗл ҙмқҳ к°ҖлҠҘм„ұмқҖ л°°м ңлҘј кі л Өн• мҲҳ мһҲлӢӨ. 섬мң м„ұ кіјлҜјм„ұ нҸҗл ҙмқҳ кІҪмҡ° 30% мқҙмғҒмқҳ лҰјн”„кө¬мҰқк°ҖмҰқмқҖ кіјлҜјм„ұ нҸҗл ҙ 진лӢЁмқҳ мӢ лў°лҸ„лҘј лҶ’мқҙлӮҳ лҰјн”„кө¬мҰқк°ҖмҰқмқҙ кҙҖм°°лҗҳм§Җ м•ҠлҚ”лқјлҸ„ 진лӢЁмқ„ л°°м ңн• мҲҳлҠ” м—ҶлӢӨ[8]. мң мңЎмў…мҰқ нҷҳмһҗмқҳ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м—җм„ңлҸ„ лҰјн”„кө¬к°Җ мҰқк°Җлҗҳм–ҙ мһҲмңјл©° CD4/CD8мқҳ 비мңЁмқҙ мҰқк°Җлҗҳм–ҙ мһ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4]. к·ё мқҙмң лҠ” лӘЁмў…мқҳ мӣҗмқё л¬јм§Ҳм—җ лҢҖн•ҳм—¬ TH1 л©ҙм—ӯ л°ҳмқ‘мқҙ мқјм–ҙлӮҳл©ҙм„ң CD4 м–‘м„ұ TлҰјн”„кө¬к°Җ мҰқк°Җн•ҳкё° л•Ңл¬ёмңјлЎң м„ӨлӘ…лҗңлӢӨ. 2016л…„ 16к°ңмқҳ л…јл¬ёмқ„ 분м„қн•ң л©”нғҖ 분м„қ м—°кө¬м—җм„ңлҠ” CD4/CD8 비мңЁмқҳ лҜјк°җлҸ„лҘј 0.70 (95% мӢ лў°кө¬к°„, 0.64-0.75), нҠ№мқҙлҸ„лҘј 0.83 (95% мӢ лў°кө¬к°„, 0.78-0.86)мңјлЎң ліҙкі н•ҳмҳҖлӢӨ[9]. нҠ№л°ңм„ұ кё°м§Ҳнҷ” нҸҗл ҙм—җм„ңлҸ„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м—җм„ң лҰјн”„кө¬ 분нҡҚмқҙ 25% мқҙмғҒ мҰқк°Җлҗҳм–ҙ мһ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мңјл©° CD4/CD8 비мңЁмқҙ к°җмҶҢлҗҳм–ҙ мһҲлҠ” мҶҢкІ¬мқҙ нқ”нһҲ кҙҖм°°лҗңлӢӨ[8].
м№ҳлЈҢм Ғ лӘ©м Ғ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Җ мқјл¶Җ нҸҗ м§Ҳнҷҳм—җ мһҲм–ҙм„ңлҠ” м№ҳлЈҢм Ғ лӘ©м ҒмңјлЎңлҸ„ нҷңмҡ©лҗңлӢӨ. м№ҳлЈҢм Ғ нҡЁкіјм—җ лҢҖн•ҙ к°ҖмһҘ мһҳ м•Ңл Өм ё мһҲлҠ” м§ҲнҷҳмқҖ нҸҗнҸ¬лӢЁл°ұмҰқ(pulmonary alveolar proteinosis)мқҙлӢӨ. мқјл°ҳм Ғмқё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јлҠ” лӢӨлҘҙкІҢ м „мӢ л§Ҳм·Ён•ҳ мқҙмӨ‘кҙҖ кё°кҙҖ лӮҙ нҠңлёҢ(double-lumen endotracheal tube) мӮҪкҙҖмқ„ мӢңн–үн•ҳм—¬ м–‘ нҸҗлҘј 분лҰ¬н•ң мғҒнғңм—җм„ң мӢңн–үлҗңлӢӨ. мөңлҢҖ 20 Lк№Ңм§Җ мғқлҰ¬м Ғ мӢқм—јмҲҳлҘј нҸҗм—җ мЈјмһ…н•ҳкі нқүл¶ҖнғҖ진мқ„ мӢңн–үн•ҳм—¬ лӢЁл°ұм„ұмқҳ л¬јм§Ҳкіј н•Ёк»ҳ л°°м•Ўмқҙ лҗҳлҸ„лЎқ н•ңлӢӨ. мқҙ м№ҳлЈҢлҘј нҶөн•ҙ нҳёнқЎкіӨлһҖ, кё°м№Ё л“ұмқҳ мҰқмғҒ л°Ҹ мӮ°мҶҢнҷ”мқҳ нҳём „мқ„ кё°лҢҖн• мҲҳ мһҲмңјл©° мҲҳл…„ лҸҷм•Ҳ нҡЁкіјк°Җ м§ҖмҶҚлҗ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10]. нҸҗнҸ¬лӢЁл°ұмҰқ нҷҳмһҗм—җм„ң inhaled GM-CSFлҘј мӮ¬мҡ©н• мҲҳ мһҲмңјлӮҳ м•„м§Ғк№Ңм§Җ ліҙнҺёнҷ”лҗҳм§Җ м•Ҡм•„ л„җлҰ¬ мӮ¬мҡ©лҗҳкі мһҲм§Җ м•ҠлӢӨ[11,12]. к·ё мҷё м§Җм§ҲнҸҗл ҙ(lipoid pneumonia) л“ұмқҳ м§Ҳнҷҳм—җм„ң м№ҳлЈҢм Ғ лӘ©м ҒмңјлЎ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Ӣңн–үн• мҲҳ мһ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13].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м—°кө¬м Ғ лӘ©м Ғмқҳ нҷңмҡ©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Җ м—°кө¬ лӘ©м ҒмңјлЎңлҸ„ кҙ‘лІ”мң„н•ҳкІҢ нҷңмҡ©лҗңлӢӨ. кІҖмІҙм—җм„ң лӢӨм–‘н•ң мғқмІҙн‘ңм§ҖмһҗлҘј 분м„қн•ҳм—¬ нҸҗ м§Ҳнҷҳмқҳ лі‘нғңмғқлҰ¬м—җ лҢҖн•ң м—°кө¬лҘј мҲҳн–үн• мҲҳ мһҲлӢӨ. к°җм—јлі‘ л°Ҹ л©ҙм—ӯн•ҷ кҙҖл Ё м—°кө¬м—җм„ңлҸ„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ҖмІҙлҠ” л§Өмҡ° мӨ‘мҡ”н•ҳкІҢ нҷңмҡ©лҗңлӢӨ. мөңк·јмқҳ COVID-19 нҢ¬лҚ°лҜ№ мӢңкё°м—җлҠ” нҷҳмһҗмҷҖ м •мғҒмқёмқҳ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мқҳ л©ҙм—ӯм„ёнҸ¬лҘј single-cell RNA sequencingмқ„ мӢңн–үн•ҳм—¬ м°ЁмқҙлҘј 비көҗ 분м„қн•ң м—°кө¬к°Җ мқҙлЈЁм–ҙм§Җкё°лҸ„ н•ҳмҳҖлӢӨ[9].
нҸҗм•” 진лӢЁ мӢ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нҷңмҡ©н•ҳлҠ” л°©лІ•лҸ„ нҷңл°ңнһҲ м—°кө¬ л°Ҹ м Ғмҡ©лҗҳкі мһҲлӢӨ. нҸҗм•”мқҳ 진лӢЁ мӢң мЎ°м§Ғн•ҷм Ғ 진лӢЁмқҙ н•„мҡ”н•ҳм§Җл§Ң нҸҗм•”мқҳ мЎ°м§Ғмқ„ м–»кё° мң„н•ң 진лӢЁ л°©лІ•мқҖ л§ҺмқҖ кІҪмҡ° м№ЁмҠөм Ғмқҙл©° кё°нқү, м¶ңнҳҲ л“ұмқҳ н•©лі‘мҰқмқҳ мң„н—ҳмқҙ лҶ’лӢӨ. м „мӢ мғҒнғңк°Җ мўӢм§Җ м•ҠмқҖ нҷҳмһҗмқҳ кІҪмҡ° 진лӢЁм Ғ мӢңмҲ мқ„ мӢңн–үн•ҳкё° м–ҙл Өмҡҙ кІҪмҡ°лҸ„ мһҲлӢӨ. л”°лқјм„ң мЎ°м§Ғ кІҖмӮ¬лҘј лҢҖмІҙн•ҳкё° мң„н•ҳм—¬ м•ЎмІҙ мғқкІҖ(liquid biopsy)мқҙ л§ҺмқҖ мЈјлӘ©мқ„ л°ӣкі мһҲмңјл©° к·ёмӨ‘ н•ң к°Җм§Җк°Җ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мқҙлӢӨ. көӯлӮҙм—җм„ңлҸ„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Ўм—җм„ң extracellular vesicleм—җм„ң мң лһҳн•ң DNAлҘј 분лҰ¬н•ҳм—¬ мң м „мһҗ ліҖмқҙлҘј кІҖм¶ңн•ҳкі мқҙлҘј м№ҳлЈҢм—җ нҷңмҡ©н•ҳлҠ” 2мғҒ м—°кө¬к°Җ 진н–үлҗҳкё°лҸ„ н•ҳмҳҖлӢӨ[11].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ҖмӮ¬мқҳ н•ңкі„мҷҖ л¬ём ңм җ
кІҖмӮ¬ мӢң н•©лі‘мҰқ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кіј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Җ 비көҗм Ғ м•Ҳм „н•ң м Ҳм°ЁмқҙлӢӨ. 20,886кұҙмқҳ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кІҖмӮ¬лҘј нӣ„н–Ҙм ҒмңјлЎң 분м„қн•ң мқҙнғҲлҰ¬м•„мқҳ лӢӨкё°кҙҖ м—°кө¬м—җм„ңлҠ” 1.08%мқҳ н•©лі‘мҰқкіј 0.02%мқҳ мӮ¬л§қлҘ мқ„ ліҙкі н•ҳмҳҖлӢӨ[14].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мқҖ 비көҗм Ғ м•Ҳм „н•ң кІҖмӮ¬лЎң к°„мЈјлҗҳм§Җл§Ң мқјл¶Җ нҷҳмһҗл“Өм—җм„ңлҠ” мң„н—ҳн•ң н•©лі‘мҰқмқҙ л°ңмғқн• мҲҳ мһҲмңјлҜҖлЎң мЈјмқҳк°Җ н•„мҡ”н•ҳлӢӨ. нқ”н•ң л¬ём ңлЎңлҠ” кІҖмӮ¬ нӣ„ мқјмӢңм Ғмқё кё°м№Ё, л°ңм—ҙ, кё°кҙҖм§ҖкІҪ мӮҪмһ… л¶Җмң„мқҳ м¶ңнҳҲ л“ұмқҙ л°ңмғқн• мҲҳ мһҲлӢӨ. л“ңл¬јкІҢлҠ” кё°кҙҖм§Җ кІҪл ЁмқҙлӮҳ нҸҗ мҶҗмғҒ, мӢ¬к°Ғн•ң кІҪмҡ° нҸҗл ҙмқҙлӮҳ м ҖмӮ°мҶҢмҰқмқҙ л°ңмғқн• мҲҳ мһҲлӢӨ. мЈјмҡ” н•©лі‘мҰқмқҖ мЈјлЎң кё°мҲ м Ғмқё л¬ём ңлӮҳ нҷҳмһҗмқҳ кё°м Җ м§Ҳнҷҳкіј кҙҖл Ён•ҳм—¬ л°ңмғқн•ҳлҜҖлЎң кІҖмӮ¬ мӢңн–ү м „ лӢЁкі„м—җм„ң м Ғм Ҳн•ң нҷҳмһҗ м„ нғқ л°Ҹ м•Ҳм „н•ң кІҖмӮ¬ кі„нҡҚмқҙ н•„мҡ”н•ҳлӢӨ.
진лӢЁмқҳ м •нҷ•м„ұ л¬ём 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진лӢЁм Ғ м •нҷ•м„ұмқҖ кІҖмӮ¬ л°©лІ•кіј н•ҙм„қм—җ л”°лқј лӢ¬лқјм§Ҳ мҲҳ мһҲлӢӨ.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ҖмІҙлҠ” нҸҗмқҳ нҠ№м • л¶Җмң„м—җм„ң мұ„м·ЁлҗҳлҜҖлЎң лі‘ліҖмқҙ к· мқјн•ҳм§Җ м•Ҡкұ°лӮҳ мһ‘мқҖ лі‘ліҖмқҙ мһҲлҠ” кІҪмҡ° м •нҷ•н•ң 진лӢЁмқҙ м–ҙл Өмҡё мҲҳ мһҲлӢӨ. лҳҗн•ң м„ёмІҷм•Ўмқҳ нҡҢмҲҳмңЁкіј кІҖмІҙмқҳ мІҳлҰ¬ л°©лІ•м—җ л”°лқј кІ°кіјк°Җ лӢ¬лқјм§Ҳ мҲҳ мһҲм–ҙ н‘ңмӨҖнҷ”лҗң м Ҳм°ЁмҷҖ кё°мҲ мқҙ мӨ‘мҡ”н•ҳлӢӨ.
к°„м§Ҳм„ұ нҸҗ м§Ҳнҷҳм—җм„ңлҸ„ м§Ҳнҷҳм—җ л”°лқј кІ°кіјк°Җ 비нҠ№мқҙм Ғмқё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м–ҙ лӘЁл“ к°„м§Ҳм„ұ нҸҗ м§Ҳнҷҳ нҷҳмһҗм—җм„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ҳ мң мҡ©м„ұм—җ лҢҖн•ҙм„ңлҠ” л…јлһҖмқҳ м—¬м§Җк°Җ мһҲлӢӨ. лӢӨн•ҷм ң нҶөн•© 진лЈҢлҘј нҸ¬н•Ён•ң лӢӨлҘё 진лӢЁ лҸ„кө¬мҷҖмқҳ лі‘н–ү мӮ¬мҡ©мқҙ н•„мҡ”н•ҳкІ мңјл©° көӯлӮҙ к°„м§Ҳм„ұ нҸҗ м§Ҳнҷҳ 진лЈҢм§Җм№Ём—җм„ңлҠ” нқүл¶Җ кі н•ҙмғҒ м „мӮ°нҷ”лӢЁмёөмҙ¬мҳҒм—җм„ң нҶөмғҒм„ұ к°„м§Ҳм„ұ нҸҗл ҙ(usual intersitial pneumonia, UIP)мқ„ ліҙмқҙм§Җ м•ҠлҠ” к°„м§Ҳм„ұ нҸҗ м§Ҳнҷҳ нҷҳмһҗм—җм„ң лҚ” 진лӢЁм—җ лҸ„мӣҖмқҙ лҗ мҲҳ мһҲлҠ” кІғмңјлЎң м ңмӢңн•ҳкі мһҲлӢӨ[8].
м ‘к·јм„ұ л¬ём 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Ӣңн–үн•ҳкё° мң„н•ҙм„ңлҠ”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л°Ҹ лӘЁлӢҲн„°л§Ғ мһҘ비к°Җ н•„мҡ”н•ҳл©° кІҖмӮ¬ нӣ„ кІҖмІҙ 분м„қмқ„ н• мҲҳ мһҲлҠ” 진лӢЁ кІҖмӮ¬ кіјм •мқҙ н•„мҡ”н•ҳлӢӨ. лҳҗн•ң кІҖмӮ¬м—җ лҢҖн•ң 충분н•ң кІҪн—ҳмқҙ мһҲлҠ” мқҳмӮ¬ л°Ҹ к°„нҳёмӮ¬ мқёл Ҙмқҙ н•„мҲҳм ҒмқҙлӢӨ. лҳҗн•ң нҷҳмһҗ мһ…мһҘм—җм„ңлҠ” 비мҡ©мқҳ л¬ём ңлҘј кі л Өн•ҙм•ј н• мҲҳ мһҲмңјл©° м „мӢ мғҒнғңк°Җ мўӢм§Җ м•ҠмқҖ кІҪмҡ°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мӢңмҲ лЎң мқён•ң н•©лі‘мҰқмқҳ мҡ°л Өк°Җ мһҲлӢӨ. мқҙлҹ¬н•ң мқҙмң лЎң мқён•ҳм—¬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ҖмӮ¬лҠ” лӘЁл“ нҷҳмһҗм—җкІҢ н•„мҲҳм ҒмңјлЎң мӢңн–үн•ҳкё°ліҙлӢӨлҠ” лӢӨлҘё 진лӢЁ л°©лІ•мңјлЎң 충분н•ң м •ліҙлҘј м–»м§Җ лӘ»н•ң кІҪмҡ° мӢңн–үн•ҳлҠ” кІғмқҙ мқјл°ҳм ҒмқҙлӢӨ.
кІ° лЎ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Җ нҸҗ м§Ҳнҷҳмқҳ 진лӢЁ л°Ҹ м№ҳлЈҢм—җ мң мҡ©н•ң кІҖмӮ¬лЎң к°җм—јм„ұ нҸҗ м§Ҳнҷҳ, к°„м§Ҳм„ұ нҸҗ м§Ҳнҷҳ л“ұмқҳ нҸүк°ҖлҘј мң„н•ҳм—¬ мӢңн–үлҗңлӢӨ.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нҶөн•ҙ к°җм—јмқҳ мӣҗмқёк· мқ„ л°қнһҲкі м—јмҰқм„ёнҸ¬лҘј м§Ғм ‘ 분м„қн•ЁмңјлЎңмҚЁ нҳёнқЎкё° м§Ҳнҷҳмқҳ 진лӢЁкіј м№ҳлЈҢм—җ нҡЁкіјм ҒмңјлЎң нҷңмҡ©н• мҲҳ мһҲлӢӨ. лҳҗн•ң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мқ„ мӢңн–үн•ҳл©ҙ лӢӨм–‘н•ң нҸҗ м§Ҳнҷҳмқҳ лі‘нғңмғқлҰ¬мҷҖ м№ҳлЈҢлҘј мқҙн•ҙн•ҳлҠ” лҚ° мӨ‘мҡ”н•ң м •ліҙлҘј м–»мқ„ мҲҳ мһҲкё° л•Ңл¬ём—җ нҳёнқЎкё° м§Ҳнҷҳмқҳ мөңмӢ м—°кө¬м—җм„ңлҸ„ н•„мҲҳм Ғмқё лҸ„кө¬мқҙлӢӨ. н•ҳм§Җл§Ң кё°кҙҖм§ҖлӮҙмӢңкІҪ л°Ҹ кё°кҙҖм§ҖнҸҗнҸ¬м„ёмІҷмҲ кіј кҙҖл Ёлҗң н•©лі‘мҰқм—җ лҢҖн•ң мң мқҳк°Җ н•„мҡ”н•ҳкі кІҖмӮ¬ мӢңн–ү нӣ„м—җлҸ„ м •нҷ•н•ң 진лӢЁмқҙ лӮҙл Өм§Җм§Җ лӘ»н• мҲҳ мһҲмқҢмқ„ мқём§Җн•ҳкі кІҖмӮ¬ мӢңн–ү м—¬л¶ҖлҘј нҢҗлӢЁн•ҳм—¬м•ј н•ңлӢ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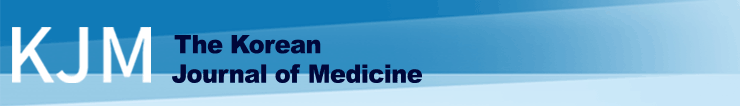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