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Korean J Med > Volume 99(6); 2024 > Article |
|
Abstract
Percutaneous kidney biopsy is a valuable diagnostic tool for the pathological evaluation of renal diseases, particularly glomerular disorders. It is crucial for guiding treatment decisions when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are uncertain.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mid-20th century, percutaneous kidney biopsy has evolved from an initial blind approach, associated with higher complication rates, to advanced methods using real-time ultrasound or computed tomography guidance and spring-loaded biopsy needles. These advancements have significantly improved tissue sampling accuracy and minimized complications, establishing percutaneous kidney biopsy as a relatively safe diagnostic procedure. Despite these improvements, the invasive nature of the procedur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areful patient selection and operator expertise. Nephrologists, as the primary operators and performers of kidney biopsy, play a pivotal role in ensuring timely and appropriate patient care.
мЛ†мЮ• м°∞мІБ к≤АмВђ лШРлКФ к≤љнФЉм†Б мЛ†мГЭк≤АмЭА мЛ†мЮ• мІИнЩШмЭШ л≥Сл¶ђнХЩм†Б мІДлЛ®мЭД мЬДнХі нХДмИШм†БмЭЄ к≤АмВђл°Ь нШДмЮђкєМмІАлПД мВђкµђм≤і мІИнЩШмЭД лєДл°ѓнХЬ лЛ§мЦСнХЬ мЛ†мІИнЩШмЭШ мІДлЛ®мЧР к≤∞м†Хм†БмЭЄ к≤АмВђл≤ХмЭілЛ§. 20мДЄкЄ∞ міИмЧРлКФ мИШмИ†м†Б мЛ†мГЭк≤АмЭі мЛЬлПДлРШмЧИмЬЉл©∞ 1951лЕД Brunк≥Љ IversonмЭі мХЙмЭА мЮРмДЄмЧРмДЬ aspiration needleмЭД мВђмЪ©нХШлКФ к≤љнФЉм†Б мЛ†мГЭк≤АмЭД лђЄнЧМмЬЉл°Ь мµЬміИ л≥ік≥†нХШмШАлЛ§[1]. мЭінЫД 1954лЕД KarkмЩА Muehrckeк∞А Vim-Silverman needleмЭД мВђмЪ©нХШмЧђ мЧОлУЬл¶∞ мЮРмДЄмЧРмДЬ мЛЬнЦЙнХШлКФ мЛ†мГЭк≤АмЭД мЖМк∞ЬнХШмШАмЬЉл©∞ мЭінЫД кЄ∞мИ†м†Б к∞ЬмД†мЭД к±∞м≥Р мШ§лКШлВ†мЧРлКФ мЛ§мЛЬк∞Д міИмЭМнММ лШРлКФ computed tomography (CT) мЬ†лПДнХШмЧР мК§нФДлІБ-мЮ•м†Д мГЭк≤Амє®(spring-loaded needle)мЭі мЮ•м∞©лРЬ мЮРлПЩ лШРлКФ л∞ШмЮРлПЩмЛЭ мГЭк≤АміЭ(biopsy gun) м°∞мІБ к≤АмВђл•Љ мЛЬнЦЙнХШк≥† мЮИлЛ§[2-4]. л≥Є лЕЉлђЄмЧРмДЬлКФ к≤љнФЉм†Б мЛ†мГЭк≤АмЧР лФ∞л•Є к≥†л†§нХШмЧђмХЉ нХ† м†РлУ§к≥Љ мЬ†мЪ©мД± м†Дл∞ШмЧР лМАнХімДЬ мЖМк∞ЬнХШк≥†мЮР нХЬлЛ§.
мЛ†мГЭк≤АмЭА мЛ†мЮ• мІИнЩШмЭШ л≥Сл¶ђнХЩм†Б мІДлЛ® л∞П нЩШмЮРмЭШ мєШл£М л∞©л≤ХмЭД к≤∞м†ХнХШкЄ∞ мЬДнХЬ л™©м†БмЬЉл°Ь мЛЬнЦЙнХШл©∞ мЮДмГБ нШДмЮ•мЧРмДЬ лђім¶ЭмГБ нЩШмЮРл•Љ лМАмГБмЬЉл°Ь лЛ®мИЬ м°∞мІБ мІДлЛ®лІМмЭД л™©м†БмЬЉл°Ь мЛЬнЦЙнХШмІАлКФ мХКлКФлЛ§. мЛ†мГЭк≤АмЧР лМАнХЬ нЖµмЭЉлРЬ м†БмЭСм¶ЭмЭілВШ мІДл£М мІАмє®мЭА мЧЖмЬЉлВШ мЮДмГБм†БмЬЉл°Ь лДРл¶ђ нЩЬмЪ©нХШлКФ к≤АмВђ м†БмЭСм¶ЭмЭА нСЬ 1к≥Љ к∞ЩлЛ§.
мЭЉл∞Шм†БмЬЉл°Ь мД±мЭЄмЭШ мЫРл∞ЬмД±(primary) мЛ†м¶ЭнЫДкµ∞мЭА нЩХмІДмЭД мЬДнХШмЧђ мЛ†мГЭк≤АмЭі нХДмИШм†БмЭілЛ§. кЈЄлЯђлВШ мЖМмХДмЭШ к≤љмЪ∞мЧРлКФ 80% мЭімГБмЭі лѓЄмДЄл≥АнЩФмЛ†м¶Э(minimal change disease, MCD)мЧР мЭШнХЬ к≤љмЪ∞л°Ь л≥ік≥†лРШк≥† мЮИк≥† мК§нЕМл°ЬмЭілУЬ мєШл£МмЧР лМАнХЬ л∞ШмЭС땆мЭі лЖТмЬЉлѓАл°Ь мЛ†мГЭк≤АмЭД л≥іл•ШнХШк≥† мЮДмГБ мІДлЛ® нЫД мєШл£Мл•Љ мЛЬнЦЙнХШлКФ к≤љмЪ∞к∞А мЭЉл∞Шм†БмЭілЛ§[5]. лЛ® мЖМмХДмЭШ к≤љмЪ∞мЧРлПД мК§нЕМл°ЬмЭілУЬмЧР мЮШ л∞ШмЭСнХШмІА мХКк±∞лВШ нШДлѓЄк≤љм†Б нШИлЗ®, мЛ†кЄ∞лК•мЭШ к∞РмЖМ, нШИм≤≠ л≥ім≤імЭШ к∞РмЖМк∞А л≥імЭілКФ к≤љмЪ∞мЧРлКФ м†ЬнХЬм†БмЬЉл°Ь мЛ†мГЭк≤АмЭД мЛЬнЦЙнХЬлЛ§[6]. 2021 KDIGO guidelinesмЧР мЭШнХШл©і лІЙмД± мВђкµђм≤імЛ†мЧЉ(membranous nephropathy, MN)мЭШ к≤љмЪ∞ мЛ†м¶ЭнЫДкµ∞мЭі лПЩл∞ШлРШмЦі мЮИмЬЉл©∞ нШИм≤≠ anti-PLA2R antibody мЦСмД±мЭЄ нЩШмЮРлКФ MN нЩХмІДмЭД мЬДнХШмЧђ мЛ†мГЭк≤АмЭі нХДмЪФнХШмІА мХКлЛ§[7]. кЈЄлЯђлВШ MN мІДлЛ® мЛЬ positive anti-PLA2R antibody testмЭШ лѓЉк∞РлПД 64-78%, нКємЭілПД 99%л°Ь л≥ік≥†лРШк≥† мЮИмЦі нШДмЛ§м†БмЬЉл°Ь мЮДмГБ нШДмЮ•мЧРмДЬлКФ мХДмІБкєМмІА MNмЧРмДЬ мЛ†мГЭк≤АмЭі мІДлЛ®мЧР м§СмЪФнХШлЛ§[8,9]. мЭім∞®мД±(secondary) мЛ†м¶ЭнЫДкµ∞мЧРмДЬлПД мІИнЩШмЭШ мЫРмЭЄ кЈЬл™Ек≥Љ мєШл£М к≥ДнЪН мИШл¶љ, мШИнЫД нМРм†ХмЭД мЬДнХШмЧђ мЛ†мЮ• м°∞мІБ к≤АмВђл•Љ мІДнЦЙнХШлКФ к≤љмЪ∞к∞А мЮИлЛ§.
лєД-мЛ†м¶ЭнЫДмД± лЛ®л∞±лЗ®(non-nephrotic range proteinuria)л•Љ л≥імЭілКФ нЩШмЮРмЧРмДЬлКФ мД†нГЭм†БмЬЉл°Ь мЛ†мГЭк≤АмЭД к≥†л†§нХ† мИШ мЮИлЛ§. MCDл•Љ м†ЬмЩЄнХЬ мЛ†м¶ЭнЫДкµ∞ м§СмЧРмДЬ нХШл£® лЛ®л∞±лЗ®к∞А 1-2 g мЭілВімЭіл©∞ лєДкµРм†Б м†ХмГБ мЛ†кЄ∞лК•мЭД л≥імЭілКФ к≤љмЪ∞к∞А мЭімЧР нХілЛєнХЬлЛ§[10]. нКєнЮИ лЛ®л∞±лЗ®мЩА лНФлґИмЦі нШДлѓЄк≤љм†Б нШИлЗ®к∞А лПЩл∞ШлРШмЦі мЮИмЭД к≤љмЪ∞ immunoglobulin A мЛ†м¶Э(IgA nephropathy)мЭД мЭШмЛђнХ† мИШ мЮИмЬЉл©∞ мЭілХМ м°∞мІБ мІДлЛ®мЭі лПДмЫАмЭі лРЬлЛ§.
нШДлѓЄк≤љм†Б нШИлЗ®(microscopic hematuria)лКФ мВђкµђм≤і мІИнЩШ, мЛ†мЮ• л∞П мЪФкіА к≤∞мДЭ, мЪФл°Ьк≥Д мҐЕлђЉ лУ± лЛ§мЦСнХЬ мЫРмЭЄмЧР мЭШнХШмЧђ л∞ЬмГЭнХ† мИШ мЮИмЬЉл©∞ нКєнЮИ мВђкµђм≤і мІИнЩШмЭШ к≤љмЪ∞ м°∞мІБ к≤АмВђл•Љ нЖµнХі нЩХмЛ§нХЬ мІДлЛ®мЭі к∞АлК•нХШлЛ§[11]. мВђкµђм≤і мІИнЩШмЭД мЛЬмВђнХШлКФ мВђкµђм≤імД± нШИлЗ®лКФ мЖМл≥А нШДлѓЄк≤љ к≤АмВђмГБ м†БнШИкµђ нШХнГЬ мЭімГБ(red blood cell [RBC] dysmorphism)мЭі лЖТмЭА лєДмЬ®л°Ь кіАм∞∞лРШл©∞ лХМл°ЬлКФ нХШл£® 0.5 g лВімЩЄл°Ь лЛ®л∞±лЗ® лШРлКФ м†БнШИкµђ мЫРм£Љ(RBC cast)к∞А лПЩл∞ШлРШлКФ к≤љмЪ∞к∞А лІОлЛ§[12].
мЫРмЭЄ лґИлґДл™ЕнХЬ кЄЙмД± мЛ†лґАм†Д лШРлКФ лІМмД± мЛ†мЮ•л≥СмЧРмДЬлПД мЛ†мГЭк≤АмЭД м†ЬнХЬм†БмЬЉл°Ь мЛЬнЦЙнХ† мИШ мЮИлЛ§[12]. мЮДмГБм†Б мЖМк≤ђ л∞П к≤АмВђмЛ§ к≤АмВђмГБ мІДлЛ®мЭі лґИлґДл™ЕнХШк±∞лВШ л≥ім°ім†Б мєШл£МмЧРлПД мЛ†кЄ∞лК• нЪМл≥µмЭі лНФлФШ к≤љмЪ∞ мІДлЛ® л∞П мєШл£М к≥ДнЪН мИШл¶љмЭД мЬДнХШмЧђ мЛ†мГЭк≤АмЭД мЛЬнЦЙнХЬлЛ§[13]. лЛ® мЦСмЄ° мЛ†мЮ•мЭШ мЮ•мґХ кЄЄмЭік∞А 8-9 cm лѓЄлІМмЭЄ к≤љмЪ∞мЧРлКФ м°∞мІБ к≤АмВђ нЫД мґЬнШИ кіА놮 нХ©л≥См¶Э л∞ЬмГЭмЭШ мЬДнЧШмЭі лЖТк≥† мЭілѓЄ мІДнЦЙлРЬ мВђкµђм≤ік≤љнЩФм¶Эк≥Љ мДЄкіА-мВђмЭімІИмДђмЬ†нЩФл°Ь мЭЄнХі м°∞мІБмЭД мґ©лґДнЮИ мЦїмІА л™їнХШмЧђ м†Бм†ИнХЬ л≥Сл¶ђнХЩм†Б мІДлЛ®мЭі мֳ놧мЪЄ мИШ мЮИлЛ§[14].
мЛ†мЮ•мЭД мє®л≤ФнХ† мИШ мЮИлКФ м†ДмЛ† мІИнЩШмЭШ мІДлЛ®мЧРмДЬлПД мЛ†мГЭк≤АмЭі мЬ†мЪ©нХШк≤М нЩЬмЪ©лРЬлЛ§. лЛєлЗ®л≥С нЩШмЮРмЭШ к≤љмЪ∞ мЛ†мЮ• кЄ∞лК•мЭі к∞РмЖМнХШлНФлЭЉлПД мЭЉл∞Шм†БмЭЄ лЛєлЗ® мЛ†мЮ•л≥С(лЛ®л∞±лЗ®, мШ§лЮЬ лЛєлЗ® мЬ†л≥С кЄ∞к∞Д, лѓЄмДЄнШИкіА нХ©л≥См¶Э лПЩл∞Ш)мЭШ мЮДмГБ мЦСмГБмЭі мЮИмЬЉл©і мІДлЛ®мЧР мЛ†мГЭк≤АмЭі нХДмИШм†БмЭімІАлКФ мХКлЛ§[15]. кЈЄлЯђлВШ лЛ®л∞±лЗ®лњРлІМ мХДлЛИлЭЉ мВђкµђм≤імД± нШИлЗ®к∞А мЮИк±∞лВШ м†Ь1нШХ лЛєлЗ®л≥СмЧРмДЬ лЛєлЗ® лІЭлІЙл≥См¶Э лШРлКФ лЛєлЗ® мЛ†к≤љл≥См¶ЭмЭі мЧЖлКФ к≤љмЪ∞, лЛєлЗ®л≥С л∞Ьл≥С 5лЕД мЭілВімЧР лЛ®л∞±лЗ®к∞А л∞ЬмГЭнХШмШАк±∞лВШ к∞СмЮСмК§лЯђмЪі мЛ†кЄ∞лК• м†АнХШк∞А мІДнЦЙлРШл©і м†БкЈєм†БмЬЉл°Ь мЛ†мГЭк≤АмЭД нЖµнХі лє†л•Є мЫРмЭЄ к∞Рл≥Д нЫД м†Бм†ИнХШк≤М мєШл£МнХШмЧђмХЉ нХЬлЛ§[16]. нХ≠м§СмД±кµђмДЄнПђмІИнХ≠м≤і(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мЧР мЭШнХЬ нШИкіАмЧЉмЭілВШ нХ≠мВђкµђм≤ікЄ∞м†АлІЙл≥С(anti-glomerular basement membrane [GBM] disease)мЭА мЮДмГБ мЦСмГБк≥Љ ANCA лШРлКФ anti-GBM нХ≠м≤імЭШ нШИм≤≠ мЦСмД± к≤АмВђ к≤∞к≥Љл°Ь мЮДмГБм†Б мІДлЛ®мЭі к∞АлК•нХШлВШ л≥Сл¶ђнХЩм†Б нЩХмІД, нЩЬлПЩмД± л∞П мДђмЬ†нЩФ м†ХлПДл•Љ нПЙк∞АнХШмЧђ мєШл£М нЫД мЛ†кЄ∞лК• нЪМл≥µ к∞АлК•мД±мЭД нМРлЛ®нХШк≥† л©імЧ≠мЦµм†Ьм†Ь нИђмЧђ мЧђлґАл•Љ к≤∞м†ХнХШкЄ∞ мЬДнХімДЬлКФ мЛ†мГЭк≤АмЭі нХДмИШм†БмЭілЛ§. лІИм∞ђк∞АмІАл°Ь л£®нСЄмК§ мЛ†мЧЉлПД нКєм†Х мЮДмГБ мЦСмГБк≥Љ мЮРк∞АнХ≠м≤і, лЛ®л∞±лЗ®, мЛ†кЄ∞лК• м†АнХШ лУ±мЬЉл°ЬлПД мІДлЛ®нХ† мИШ мЮИмЬЉлВШ мЛ†мГЭк≤АмЭД нЖµнХі л£®нСЄмК§ мЛ†мЧЉмЭШ л≥Сл≥А лґДл•Ш, мІИл≥С нЩЬмД±лПД л∞П мДђмЬ†нЩФ м†ХлПДл•Љ нММмХЕнХШмЧђ кµђм≤ім†БмЭЄ мєШл£М к≥ДнЪНмЭД мИШл¶љнХ† мИШ мЮИлЛ§[17]. мЭі л∞ЦмЧРлПД к≥®мИШмҐЕ, мХДл∞Ал°ЬмЭілУЬм¶Э, мВђл•імљФмЭілУЬм¶Эк≥Љ к∞ЩмЭА м†ДмЛ† мІИнЩШмЭШ мЛ†мЮ• мє®л≤ФлПД м°∞мІБ к≤АмВђл°Ь мІДлЛ®нХ† мИШ мЮИлЛ§[18].
мЛ†мЮ• мЭімЛЭ нЫД мЛ†кЄ∞лК• к∞РмЖМк∞А мЮИмЭД лХМ мЭімЛЭнОЄмЧР лМАнХЬ м°∞мІБ к≤АмВђлКФ мЭімЛЭ к±∞лґА л∞ШмЭС, л©імЧ≠мЦµм†Ьм†Ь мЛ†лПЕмД±, кЄ∞нЪМк∞РмЧЉ, кЄ∞м†А мВђкµђм≤і мІИнЩШмЭШ мЮђл∞Ь лУ±мЭШ к∞Рл≥Д мІДлЛ®к≥Љ мєШл£М к≥ДнЪН, мШИнЫД лУ±мЧР нХДмЪФнХЬ м†Хл≥іл•Љ м†Ьк≥µнХЬлЛ§[19]. кµ≠лВімЩЄ мЧђлЯђ мЛ†мЮ• мЭімЛЭ кЄ∞кіАмЧРмДЬлКФ мИШмИ† нЫД лђім¶ЭмГБ кЄЙмД± л∞П лІМмД± к±∞лґА л∞ШмЭСмЭШ м°∞кЄ∞ мІДлЛ®к≥Љ л©імЧ≠мЦµм†Ьм†Ь мД†нГЭ лУ±мЧР нХДмЪФнХЬ м†Хл≥іл•Љ мЦїкЄ∞ мЬДнХШмЧђ мИШмИ† нЫД 2м£Љ, 3к∞ЬмЫФ, 6к∞ЬмЫФ, 1лЕД лУ± м£ЉкЄ∞м†БмЬЉл°Ь нФДл°ЬнЖ†мљЬ мГЭк≤А(protocol biopsy)мЭД мЛЬнЦЙнХЬлЛ§[19].
мЛ†мГЭк≤АмЭА мє®мКµм†БмЭЄ м°∞мІБ м±ДмЈ®к∞А лґИк∞АнФЉнХШмЧђ мґЬнШИмЭШ мЬДнЧШмЭі лТ§лФ∞л•ілѓАл°Ь мЛ†мГЭк≤А м†ДмЧРлКФ л∞ШлУЬмЛЬ к≤АмВђмЩА кіА놮лРЬ мЬДнЧШ мЪФмЭЄмЭД мВђм†ДмЧР нПЙк∞АнХШмЧђ мХИм†ДнХШк≥† мД±к≥µм†БмЬЉл°Ь к≤АмВђл•Љ мЛЬнЦЙнХШлРШ нХ©л≥См¶ЭмЭД мШИл∞©нХ† мИШ мЮИлПДл°Э к≥ДнЪНнХШмЧђмХЉ нХЬлЛ§[20]. мЛ†мГЭк≤АмЭШ кЄИкЄ∞м¶ЭмЭА 1980лЕДлМАмЧР м†Хл¶љлРЬ нЫДмЧР нШДмЮђкєМмІАлПД мЬ†мВђнХШк≤М мЬ†мІАлРШк≥† мЮИмЬЉл©∞ м†ИлМАм†БмЭЄ кЄИкЄ∞м¶Эк≥Љ нЩШмЮРмЭШ мєШл£М к≤љк≥ЉмГБ м°∞мІБ к≤АмВђмЭШ м§СмЪФмД±, мЛЬмИ†мЮРмЭШ мИЩ놮лПД, мЛЬмД§к≥Љ мЮ•лєДмЭШ мИШм§АмЧР лФ∞лЭЉ мЛ†м§СнХШк≤М к≤АмВђ мЛЬнЦЙмЭД к≥†л†§нХ† мИШ мЮИлКФ мГБлМАм†Б кЄИкЄ∞м¶ЭмЬЉл°Ь лґДл•ШлРЬлЛ§(Table 2) [11,21].
кЄ∞л≥Єм†БмЬЉл°Ь нЩШмЮРмЭШ мґЬнШИ мЖМмЭЄмЭА л∞ШлУЬмЛЬ кµРм†ХлРШмЦімХЉ нХШл©∞ кЄ∞м†А мІИнЩШ, мХљм†Ь л≥µмک놕 лУ±мЧР лМАнХі мВђм†ДмЧР мГБмДЄнЮИ л≥С놕 м°∞мВђл•Љ нХШмЧђмХЉ нХЬлЛ§. мХИм†ДнХЬ к≤АмВђк∞А мЭіл£®мЦімІА놧멳 нШИмЖМнМР > 70,000-100,000/mL, prothrombin time INR < 1.2,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м∞Єк≥†мєШмЭШ 1.2л∞∞ мЭілВілЭЉлКФ м°∞к±імЭі мґ©м°±лРШмЦімХЉ нХЬлЛ§. л≥інЖµ aspirin, clopidogrel, ticagrelor, prasugrelмЭА к≤АмВђ 7мЭЉ м†Д, warfarinмЭА к≤АмВђ 5мЭЉ м†Д, new-oral anticoagulantлКФ к≤АмВђ 3мЭЉ м†Д, low-molecular weight heparinмЭА к≤АмВђ 1мЭЉ м†ДлґАнД∞ м§СлЛ®мЭі кґМк≥†лРЬлЛ§[22]. нХ≠нШИмЖМнМРм†Ь л∞П нХ≠мЭСк≥†м†ЬмЭШ мЮђл≥µмЪ©мЭА к≤АмВђ 2-3мЭЉ нЫДмЧР мґЬнШИ кіА놮 нХ©л≥См¶ЭмЭі мЧЖмЭД лХМ к∞АлК•нХШлЛ§. мЪФлПЕм¶Э(uremia) нЩШмЮРмЭШ к≤љмЪ∞ нШИмХ° мЭСк≥†мЩА кіА놮лРЬ von Willebrand factor (vWF)мЭШ нЩЬмД± м†АнХШл°Ь мЭЄнХШмЧђ мґЬнШИ мЖМмЭЄмЭі м¶Эк∞АнХ† мИШ мЮИлЛ§. мЭі лХМ antidiuretic hormoneмЭШ нХ©мД± мЬ†лПДм≤імЭЄ desmopressin (1-deamino-8-D-arginine vasopressin)мЭА нШИм§С vWFмЩА factor VIII levelмЭД лЖТмЮДмЬЉл°ЬмН® мґЬнШИ мЛЬк∞Д(bleeding time)мЭі мЧ∞мЮ•лРЬ нЩШмЮРмЭШ мґЬнШИ мД±нЦ•мЭД кµРм†ХнХ† мИШ мЮИлКФ к≤ГмЬЉл°Ь л≥ік≥†лРШмЧИлЛ§[23]. Manno лУ±[24]мЭШ лЛ®мЭЉ кЄ∞кіА мЧ∞кµђмЧРмДЬлКФ 162л™ЕмЭШ мЛ†мЮ• м°∞мІБ к≤АмВђ нЩШмЮР(serum creatinine вЙ§ 1.5 mg/dL and/o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вЙ• 60 mL/min/1.73 m2)мЧРк≤М мЛ†мГЭк≤А 1мЛЬк∞Д м†Д desmopressin 0.3 ¬µg/kgмЭД нИђмЧђнХЬ к≤љмЪ∞ лМАм°∞кµ∞мЧР лєДнХі мґЬнШИ нХ©л≥См¶ЭмЭі мЬ†мЭШлѓЄнХШк≤М к∞РмЖМнХ®мЭД нЩХмЭЄнХШмШАлЛ§(relative risk, 0.45; 95% confidence interval, 0.24-0.85; p= 0.01). кЈЄлЯђлВШ мЭімЩА кіА놮лРЬ лМАкЈЬл™® мЧ∞кµђлКФ лґАм°±нХШмЧђ к≥†мЬДнЧШ нЩШмЮРмЭШ мЛ†мГЭк≤А м†Д desmopressin мВђмЪ©мЭШ мЬ†мЪ©мД±мЭА мХДмІБ л™ЕнЩХнХШмІАлКФ мХКлЛ§[11,25].
мґЬнШИ мЖМмЭЄ мЩЄмЧР мЛ†мГЭк≤А лМАмГБмЮРмЭШ к≥†нШИмХХлПД к≤АмВђ нХ©л≥См¶ЭмЭШ л∞ЬмГЭк≥Љ л∞Ам†СнХЬ кіА놮мЭі мЮИлЛ§. нХЬ мШИл°Ь м°∞м†ИлРШмІА мХКлКФ к≥†нШИмХХ(мИШмґХкЄ∞ нШИмХХ > 140 mmHg лШРлКФ мЭімЩДкЄ∞ нШИмХХ > 90 mmHg)мЭі мЮИлКФ нЩШмЮРлКФ мЛ†мГЭк≤А нЫД мИШнШИ лШРлКФ нШИкіА м§СмЮђмИ†мЭі нХДмЪФнХЬ мИШм§АмЭШ м§СлМАнХЬ мґЬнШИ нХ©л≥См¶ЭмЭі л∞ЬмГЭнХ† мЬДнЧШмЭі нШИмХХмЭі м°∞м†ИлРШлКФ кµ∞мЧР лєДнХі мХљ 10л∞∞ лЖТмЭА к≤ГмЬЉл°Ь л≥ік≥†лРШмЧИлЛ§[26]. лЛ§л•Є мЧ∞кµђмЧРмДЬлКФ мИШмґХкЄ∞ нШИмХХмЭі 160 mmHgл•Љ міИк≥ЉнХШлКФ к≤љмЪ∞ мґЬнШИ нХ©л≥См¶ЭмЭШ л∞ЬмГЭ땆мЭі 10.71%, 160 mmHg мЭінХШмЭЄ к≤љмЪ∞ 5.25%мШАлЛ§(p< 0.03) [27]. лФ∞лЭЉмДЬ к≤љкµђ лШРлКФ м†ХлІ• нШИмХХк∞ХнХШм†Ьл•Љ нИђмХљнХШмЧђ мЛ†мГЭк≤А м†Д нШИмХХмЭД 140/90 mmHg лѓЄлІМмЬЉл°Ь мЬ†мІАнХШлКФ к≤ГмЭА мґЬнШИ кіА놮 нХ©л≥См¶ЭмЭШ мШИл∞©мЧР м§СмЪФнХШлЛ§[11].
к≤љнФЉм†Б мЛ†мГЭк≤АмЭА мЛ†мЮ•лВік≥Љ лШРлКФ мШБмГБмЭШнХЩк≥Љ мЭШмВђк∞А мЛЬнЦЙнХШл©∞ мЭЉл∞Шм†БмЬЉл°Ь мЧОлУЬл¶∞ мЮРмДЄ(prone position)мЧРмДЬ кµ≠мЖМлІИмЈ® нЫД мЛ§мЛЬк∞Д міИмЭМнММ мЬ†лПДнХШмЧР мЛЬнЦЙнХЬлЛ§. мЭімЛЭнОЄ мЛ†мГЭк≤АмЭА мЭімЛЭмЛ†мЭі л≥інЖµ мЪ∞мЄ° лШРлКФ мҐМмЄ° мЮ•к≥®мЩА(iliac fossa)мЧР мЬДмєШнХШлѓАл°Ь л∞ШлУѓнХШк≤М лИДмЪі мЮРмДЄ(supine position)мЧРмДЬ мІДнЦЙнХЬлЛ§. к≤љмЪ∞мЧР лФ∞лЭЉ нЩШмЮРмЭШ нОЄмЭШмЩА міИмЭМнММ мЛЬмХЉ нЩХл≥іл•Љ мЬДнХШмЧђ л≥µлґА мХДлЮШмЧР л≤†к∞ЬлВШ л™®лЮШм£Љл®ЄлЛИл•Љ лД£мЦі мІАмІАнХШкЄ∞лПД нХЬлЛ§[22]. мЮДмВ∞лґАлВШ мЭЄк≥µнШЄнЭ°кЄ∞л•Љ мВђмЪ© м§СмЭЄ нЩШмЮРмЧРмДЬлКФ лИДмЪі мЮРмДЄмЧРмДЬ мГЭк≤А м™љ мЄ°л©імЭД 30¬∞ м†ХлПД мШђл¶∞ мЮРмДЄ(supine anterolateral position)мЧРмДЬ мЛЬнЦЙнХ† мИШ мЮИлЛ§[22].
мЛ†мГЭк≤А м†Д міИмЭМнММ к≤АмВђлКФ мЛ†мЮ•мЭШ нБђкЄ∞, мЬДмєШ, м†СкЈЉл°Ьл•Љ нММмХЕнХШлКФ лН∞ нЩЬмЪ©нХШл©∞ мЭілХМ м≤ЬмЮР лґАмЬДл•Љ мВђм†ДмЧР нЩШмЮР нФЉлґАмЧР нСЬмЛЬнХШл©і к≤АмВђ мІДнЦЙмЧР мЪ©мЭінХШлЛ§. мЫРмєЩмГБ нФЉлґАмЧРмДЬ мЛ†мЮ•кєМмІА мµЬлЛ® к≤љл°ЬмЭЄ к≥≥мЭД м≤ЬмЮР лґАмЬДл°Ь мД†нГЭнХШмЧђмХЉ нХШл©∞ мЛ†мЮ• нФЉмІИкєМмІАмЭШ к≤љл°ЬмГБ нШИкіА, к∞Д, лєДмЮ•, мЮ• лУ± лЛ§л•Є мЮ•кЄ∞лВШ лВ≠мҐЕ лУ±мЭШ л≥Сл≥АмЭі мЧЖмЦімХЉ нХЬлЛ§. мЭЉл∞Шм†БмЬЉл°ЬлКФ мҐМмЄ° мЛ†мЮ•мЭШ нХШкЈє(inferior pole)мЭі нБ∞ нШИкіАмЭі мЧЖмЦі мГЭк≤А мЬДмєШл°Ь м†БнХ©нХШлЛ§. нФЉлґА мЖМлПЕмЭА povidone-iodine лШРлКФ chlorohexidine мЪ©мХ°мЬЉл°Ь мЛЬнЦЙнХШл©∞ кµ≠мЖМ лІИмЈ®мЧРлКФ 1-2% lidocaine hydrochlorideл•Љ мВђмЪ©нХЬлЛ§. м≤ЬмЮР лґАмЬД нФЉлґАл•Љ лІИмЈ®нХЬ нЫД 21 gauge spinal needleмЭД мВђмЪ©нХШмЧђ нФЉнХШм°∞мІБлґАнД∞ мЛ†мЮ• нФЉлІЙкєМмІА мГЭк≤Амє®мЭі мІАлВШк∞И к≤љл°ЬмЧР кµ≠мЖМлІИмЈ®м†Ьл•Љ м£ЉмЮЕнХШл©∞ мЭілХМ нШИмХ°мЭі нЭ°мЭЄлРШмІА мХКлКФмІА нЩХмЭЄнХШмЧђмХЉ нХЬлЛ§[3].
мГЭк≤Амє®(biopsy needle)мЭШ кµµкЄ∞лКФ 14, 16, 18 gaugeк∞А мЮИмЬЉл©∞ м£Љл°Ь 16 лШРлКФ 18 gaugeл•Љ лІОмЭі мВђмЪ©нХШлКФлН∞ 14, 16 gaugeлКФ мґ©лґДнХЬ мВђкµђм≤і мИШл•Љ нЩХл≥інХШлКФ лН∞ мЬ†л¶ђнХЬ л∞Шл©імЧР 18 gaugeлКФ мґЬнШИ нХ©л≥См¶ЭмЭШ л∞ЬмГЭмЭі м†БмЭА мЮ•м†РмЭі мЮИлЛ§[11,28,29]. нШДмЮђлКФ spring-loaded biopsy gunмЭД мВђмЪ©нХШмЧђ к≤Ам≤іл•Љ нЪНлУЭнХШл©∞ мГЭк≤А м°∞мІБ(biopsy core)мЭШ кЄЄмЭілКФ л≥інЖµ 1.5-2.0 cmк∞А м†Бм†ИнЮИ нЪНлУЭлРЬ к≤ГмЬЉл°Ь нМРлЛ®нХЬлЛ§[3]. мЭімГБм†БмЬЉл°ЬлКФ нХШлВШмЭШ coreлЛє нПЙкЈ† 15-20к∞Ь мВђкµђм≤іл•Љ нПђнХ®нХШлКФ к≤ГмЭі мЭімГБм†БмЭілВШ л≥Сл¶ђнХЩм†Б мІДлЛ®мЭД мЬДнХЬ мВђкµђм≤імЭШ мµЬмЖМ к∞ЬмИШлКФ native kidneyмЭШ к≤љмЪ∞ 10-15к∞Ь мЭімГБ, мЭімЛЭнОЄмЭШ к≤љмЪ∞ мµЬмЖМ 7-10к∞Ьк∞А кґМмЮ•лРЬлЛ§[30,31]. мЛ†мГЭк≤АмЭД нХЬ л≤И нЦЙнХ† лХМ 2нЪМ м°∞мІБмЭД м±ДмЈ®нХШлКФ к≤ГмЭі мЭЉл∞Шм†БмЭіл©∞ м°∞мІБлЯЙмЭі лґАм°±нХ† к≤љмЪ∞ 4-5нЪМл•Љ міИк≥ЉнХШмЧђ к≤АмВђл•Љ мЛЬлПДнХШлКФ к≤ГмЭА мґЬнШИмЭШ мЬДнЧШмЭД м¶Эк∞АмЛЬнВ§лѓАл°Ь кґМмЮ•лРШмІА мХКлКФлЛ§[11]. к≤АмВђмЮРлКФ м°∞мІБмЭД нЪНлУЭнХШмЮРлІИмЮР мГЭк≤Амє®мЧРмДЬ м°∞мЛђмК§лЯљк≤М лґДл¶ђнХЬ нЫД нШДмЮ•мЧРмДЬ кіСнХЩнШДлѓЄк≤љмЭД мВђмЪ©нХШмЧђ мВђкµђм≤і м°імЮђ мЧђлґА лУ±мЭД нЩХмЭЄнХШк≥† мґФк∞А к≤АмВђ мІДнЦЙ мЧђлґАл•Љ к≤∞м†ХнХШмЧђмХЉ нХЬлЛ§. нКєнЮИ мЮДмГБм†БмЬЉл°Ь мЭШмЛђлРШлКФ мІДлЛ®мЭі мЮИмЭД лХМмЧРлКФ мШИл¶ђнХЬ bladeл•Љ мВђмЪ©нХШмЧђ м°∞мІБмЭД лґДнХ†нХШк≥† к≤АмВђл≥Дл°Ь м†Бм†ИнХЬ к≥†м†ХмХ°мЧР мЛ†мЖНнЮИ лД£мЭМмЬЉл°ЬмН® мІДлЛ®мЭШ м†ХнЩХлПДл•Љ лЖТмЭЉ мИШ мЮИлЛ§. кіСнХЩнШДлѓЄк≤љ к≤АмВђмЭШ к≥†м†ХмХ°мЭА 10% buffered-aqueous formaldehyde solution (formalin)мЭД мВђмЪ©нХШл©∞ м†ДмЮРнШДлѓЄк≤љ к≤АмВђмЭШ к≥†м†ХмХ°мЭА 1-3% glutaraldehyde лШРлКФ 1-4% paraformaldehydeл•Љ мВђмЪ©нХЬлЛ§. л©імЧ≠нШХкіСнШДлѓЄк≤љ к≤Ам≤ілКФ кЄЙмЖНлПЩк≤∞л≤ХмЭілВШ Michel transport mediaл•Љ мВђмЪ©нХЬлЛ§[31].
мЛ†мГЭк≤АмЭА к≤АмВђл≤Х к∞Ьл∞Ь міИкЄ∞лґАнД∞ мЛ†мЮ•лВік≥Љ мЭШмВђк∞А к±∞мЭШ лПЕм†Рм†БмЬЉл°Ь мЛЬнЦЙнХШмШАмЬЉлВШ мЛ†мЮ•лВік≥Љ мЭШмВђмЭШ мІДл£МлЯЙ м¶Эк∞АмЧР лФ∞л•Є мЛЬк∞Дм†Б м†ЬмХљ, мИШ놮 м§С к≤АмВђ мИ†кЄ∞мЧР лМАнХЬ к≤љнЧШ лґАм°± л∞П л≤Хм†Б м±ЕмЮД лђЄм†Ь, м§СмЮђмЛЬмИ† мШБмГБмЭШнХЩмЭШ мШБмЧ≠ нЩХмЮ• лУ±мЬЉл°Ь мµЬкЈЉ 20мЧђ лЕДк∞Д к≤АмВђ мИШнЦЙмЮРмЭШ кµђлПДмЧР л≥АнЩФк∞А мГЭкЄ∞кЄ∞ мЛЬмЮСнХШмШАлЛ§[32]. лѓЄкµ≠мЭШ к≤љмЪ∞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мЧР мЭШнХЬ мЛ†мГЭк≤А мИШнЦЙ땆мЭА 1990лЕДлМА міИмЧРлКФ 95%мШАмЬЉлВШ 2011лЕДмЧРлКФ 55%л°Ь к∞РмЖМнХШлКФ к≤љнЦ•мЭі нЩХмЭЄлРШмЧИлЛ§. лШРнХЬ лЕЄл•імЫ®мЭімЧРмДЬлКФ 1998лЕДлґАнД∞ 2010лЕД мВђмЭімЧР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мЧР мЭШнХЬ мЛ†мГЭк≤А лєДмЬ®мЭі 33.4%мШАк≥† м§СмЮђмЛЬмИ† мШБмГБмЭШнХЩк≥Љ м†ДлђЄмЭШмЧР мЭШнХЬ к≤АмВђ лєДмЬ®мЭА 53.5%л°Ь нЩХмЭЄлРШмЦі кЊЄм§АнЮИ мЛ†мГЭк≤АмЭШ мИШнЦЙ м£Љм≤ік∞А л≥АнЩФнХШк≥† мЮИмЭМмЭД л≥ік≥†нХШмШАлЛ§[23]. 1985лЕДлґАнД∞ 2017лЕДкєМмІА лѓЄкµ≠мЭШ нХЬ кЄ∞кіАмЧРмДЬ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 мИШ놮мЭД лІИмєЬ мЭШмВђл•Љ лМАмГБмЬЉл°Ь нХЬ мД§лђЄм°∞мВђмЧРмДЬлКФ мЭСлЛµмЮРмЭШ 85%к∞А мЛ†мГЭк≤А мИШнЦЙмЭД мЬДнХЬ мИШ놮 л∞П м§АлєДк∞А м†Бм†ИнХШк≤М лРШмЧИлЛ§к≥† нХШмШАмЬЉлВШ мЛ§м†Ьл°ЬлКФ мХљ 35%лІМмЭі мЛ†мГЭк≤АмЭД мИШнЦЙнХЬ к≤ГмЬЉл°Ь л∞ЬнСЬнХШмШАлЛ§[33]. лШРнХЬ мІДл£М кіА놮 мЛ§лђі к≤љл†•мЭі 10лЕД мЭілВімЭЄ мЭШмВђмЭШ 65%лКФ мЛ†мГЭк≤АмЭД нХЬ л≤ИлПД мИШнЦЙнХШмІА мХКмХШк±∞лВШ 5лЕД мЭілВімЧР к≤АмВђл•Љ м§СлЛ®нХШмШАлЛ§к≥† л≥ік≥†нХШмШАлЛ§[33,34].
к≥Љк±∞мЧР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лКФ м£Љл°Ь 14 gauge лШРлКФ 16 gauge needleл°Ь к≤АмВђл•Љ нХШлКФ л∞Шл©і мШБмГБмЭШнХЩк≥Љ м†ДлђЄмЭШлКФ 18 gauge needleмЭД мВђмЪ©нХШлКФ к≤љнЦ•мЭі мЮИмЧИлЛ§[32]. лФ∞лЭЉмДЬ м†ДнЖµм†БмЬЉл°Ь м°∞мІБмЭШ мґ©лґДнХЬ нЪНлУЭ땆мЧР мЮИмЦімДЬ мЛ†мЮ•лВік≥Љ мЭШмВђлУ§мЧР мЭШнХЬ к≤АмВђк∞А мЬ†л¶ђнХШк≥† к≤АмВђ лґАмЮСмЪ©мЭА лСР мИШнЦЙмЮРлУ§ мВђмЭімЧР м∞®мЭік∞А мЧЖмЭМмЭД м£ЉмЮ•нХШмЧђ мЛ†мЮ• мІИнЩШмЭШ м†Бм†ИнХЬ мІДлЛ®мЭД мЬДнХімДЬ мЛ†мЮ•лВік≥Љ мЭШмВђлУ§мЭШ к≤АмВђ мИШнЦЙмЭД кґМмЮ•нХШмШАлЛ§. нХЬнОЄ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мЩА м§СмЮђмЛЬмИ† мШБмГБмЭШнХЩк≥Љ м†ДлђЄмЭШмЭШ мЛ†мГЭк≤А мД±м†БмЭА мЧ∞кµђлІИлЛ§ м∞®мЭік∞А мЮИмЧИлЛ§. лѓЄкµ≠ нХДлЭЉлНЄнФЉмХДмЭШ лЛ®мЭЉ кЄ∞кіАмЧРмДЬ 2008лЕДлґАнД∞ 2011лЕД мВђмЭімЧР мЛЬнЦЙнХЬ 378к±імЭШ мЛ†мГЭк≤АмЭД лґДмДЭнХШмШАмЭД лХМ coreлЛє мВђкµђм≤і мИШлКФ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 лШРлКФ мЩЄк≥Љ м†ДлђЄмЭШлКФ 9.09 ¬± 5.17к∞Ь, м§СмЮђмЛЬмИ† мШБмГБмЭШнХЩк≥Љ м†ДлђЄмЭШлКФ 19.17 ¬± 11.11к∞ЬмШАлЛ§(p< 0.0001) [35]. нХЬнОЄ лЛ§л•Є мЧ∞кµђмЧРмДЬлКФ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мЩА м§СмЮђмЛЬмИ† мШБмГБмЭШнХЩк≥Љ м†ДлђЄмЭШ мЦС кµ∞ к∞Д core лЛє мВђкµђм≤і мИШлУЭ땆мЭі нЖµк≥Дм†БмЬЉл°Ь м∞®мЭік∞А мЧЖмЧИк≥†(26.87 vs. 26.80, p= 0.67) к≤АмВђ нЫД мґЬнШИ кіА놮 нХ©л≥См¶Э л∞ЬмГЭ땆лПД мЬ†мВђнХШмШАлЛ§[36]. мµЬкЈЉ лѓЄкµ≠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л•Љ лМАмГБмЬЉл°Ь нХЬ мД§лђЄм°∞мВђ мЧ∞кµђмЧРмДЬлКФ кЄ∞кіА лВі м§СмЮђмЛЬмИ† лЛілЛє мЭШмВђмЩАмЭШ кіАк≥Д, мЛЬмИ† мД±м†Б, м†СкЈЉмД±мЧР лФ∞лЭЉ к≤АмВђл•Љ мЭШлҐ∞нХ† мЭШнЦ•мЭі мЮИмЭМмЭД л≥ік≥†нХШмШАлЛ§[37].
кµ≠лВімЭШ к≤љмЪ∞ мЛ†мГЭк≤А мИШнЦЙ м£Љм≤імЧР лМАнХЬ к≥µмЛЭ нЖµк≥ДлКФ л∞ЬнСЬлРШмІА мХКмХШмЬЉлВШ лМАм≤іл°Ь лМАнХЩл≥СмЫРкЄЙ кЄ∞кіАмЧРмДЬ мВђкµђм≤і мІИнЩШмЭД лєДл°ѓнХЬ мЛ†мІИнЩШмЭШ мІДлЛ®мЧР нХДмЪФнХЬ к≤АмВђлКФ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 м£ЉлПДнХШмЧР 16 gauge лШРлКФ 18 gauge needleмЭД мВђмЪ©нХШмЧђ мЭіл£®мЦімІАк≥† мЮИлЛ§. мЭЉлґА мЛ†мҐЕмЦС лШРлКФ мЛ†нФЉмІИмЭШ к≤љнФЉм†Б м†СкЈЉмЭі мֳ놧мЪі к≤љмЪ∞ лґАлґДм†БмЬЉл°Ь м§СмЮђ мЛЬмИ† мШБмГБмЭШнХЩк≥Љ м†ДлђЄмЭШмЧРк≤М мЮРлђЄнШХ к≤АмВђк∞А мЛЬнЦЙлРШк≥† мЮИк≥† нХДмЪФмЧР лФ∞лЭЉ 16 gauge needleмЭШ мВђмЪ©мЭД мЪФм≤≠нХШмЧђ к≤Ам≤іл•Љ нЪНлУЭнХШлКФ к≤љмЪ∞к∞А мЮИлЛ§.
мЛ†мГЭк≤Ак≥Љ кіА놮лРЬ нХ©л≥См¶ЭмЭА нСЬ 3мЧР м†Хл¶ђлРШмЦі мЮИлЛ§. мґЬнШИмЭА мЛ†мГЭк≤А нЫД к∞АмЮ• нЭФнХЬ нХ©л≥См¶ЭмЬЉл°Ь мґЬнШИ мЖМмЭЄмЭі мЧЖлКФ нЩШмЮРмЧРмДЬлПД к∞АмЮ• нЭФнХШк≤М л∞ЬмГЭнХЬлЛ§. к≤АмВђ мІБнЫДмЧР мХљ нЩШмЮРмЭШ мХљ 86%мЧРмДЬ міИмЭМнММ кіАм∞∞ мЛЬ мЛ†мЮ• м£ЉмЬД нШИмҐЕмЭі кіАм∞∞лРШл©∞ мЭЉмЛЬм†БмЭЄ лѓЄмДЄнШИлЗ®лКФ к±∞мЭШ лМАлґАлґДмЭШ нЩШмЮРмЧРмДЬ л∞ЬмГЭнХ† мИШ мЮИлЛ§[29]. кЈЄлЯђлВШ 6-8мЛЬк∞Д мЭілВімЧР нШИмГЙмЖМ мИШмєШк∞А мХИм†Хм†БмЬЉл°Ь мЬ†мІАлРШл©і 24мЛЬк∞Д мЭілВімЧР мґЬнШИк≥Љ кіА놮лРЬ мґФк∞А нХ©л≥См¶ЭмЭШ л∞ЬмГЭ мЬДнЧШмД±мЭА лВЃлЛ§[38,39]. мЛ§м†Ьл°Ь м†БнШИкµђ мИШнШИмЭі нХДмЪФнХ† м†ХлПДмЭШ нШИмҐЕмЭА 0.1-1.6% м†ХлПДл°Ь л≥ік≥†лРШл©∞ мГЙм†ДмИ†мЭі нХДмЪФнХЬ к≤љмЪ∞лКФ 1% лѓЄлІМмЭілЛ§[30]. мЬ°мХИ нШИлЗ®к∞А мІАмЖНлР† к≤љмЪ∞мЧРлКФ нШИм†Д нШХмД±мЬЉл°Ь мЭЄнХі мЪФл°Ь нПРмГЙмЭі л∞ЬмГЭнХ† мИШ мЮИк≥† мЛђнХШл©і мЛ†нЫДмД± кЄЙмД± мЛ†лґАм†ДмЬЉл°Ь мІДнЦЙнХ† мИШ мЮИмЬЉлѓАл°Ь мЬ°мХИм†Б нШИлЗ®к∞А мІАмЖНлР† лХМмЧРлКФ лПДлЗ®кіА мВљмЮЕк≥Љ л∞©кіС мДЄм≤ЩмЭД м†БкЈєм†БмЬЉл°Ь к≥†л†§нХШмЧђмХЉ нХЬлЛ§.
мґЬнШИ кіА놮 нХ©л≥См¶ЭмЭШ мЬДнЧШ мЭЄмЮРлКФ 14 gauge needleмЭШ мВђмЪ©, serum creatinine > 2.0 mg/dL, кЄ∞м†А hemoglobin < 12 g/dL, кЄЙмД± мЛ†лґАм†Д, к≥†нШИмХХ кЄ∞мЩХ놕 лУ±мЭі мЮИлЛ§[11]. мґЬнШИ нХ©л≥См¶ЭмЭШ л∞ЬмГЭ땆мЭД лВЃмґФкЄ∞ мЬДнХімДЬлКФ к≤АмВђ м†ДнЫДл°Ь к≤љкµђ лШРлКФ м†ХлІ• нШИмХХк∞ХнХШм†Ьл•Љ мВђмЪ©нХШмЧђ нШИмХХмЭД 140/90 mmHg лѓЄлІМмЬЉл°Ь м°∞м†ИнХШк≥† к≤АмВђ нЫД мµЬмЖМ 4-6мЛЬк∞Д лПЩмХИ мє®мГБмЧРмДЬ л∞ШлУѓнХШк≤М лИДмЪі мЮРмДЄл°Ь м†ИлМА мХИм†ХмЭД мЈ®нХШмЧђмХЉ нХЬлЛ§. лШРнХЬ к≤АмВђ нЫД 4-6мЛЬк∞Д мЭілВімЧР нШИмХ°к≥Љ мЖМл≥А к≤АмВђл•Љ мЛЬнЦЙнХШмЧђ мґЬнШИ мІДнЦЙ мЧђлґАл•Љ нЩХмЭЄнХШмЧђмХЉ нХЬлЛ§. WhittierмЩА KorbetмЭШ мЧ∞кµђ[40]мЧР мЭШнХШл©і к≤љнФЉм†Б мЛ†мГЭк≤Ак≥Љ кіА놮лРЬ нХ©л≥См¶ЭмЭА к≤АмВђ нЫД 4мЛЬк∞Д мЭілВімЧР 42%, 8мЛЬк∞Д мЭілВімЧР 67%, 12мЛЬк∞Д мЭілВімЧР 85%, 24мЛЬк∞Д мЭілВімЧР 89% м†ХлПДл°Ь л≥ік≥†лРШл©∞ мЛ†мГЭк≤А к≤АмВђ нЫД 24мЛЬк∞ДкєМмІА мХИм†Х л∞П к≤љк≥Љ кіАм∞∞мЭД кґМк≥†нХШмШАлЛ§.
мґЬнШИ мЭімЩЄмЧРлПД к≤АмВђ лґАмЬД нЖµм¶ЭмЭі мХљ 4-30% м†ХлПД л∞ЬмГЭнХШл©∞ м£Љл°Ь лІИмЈ® нЪ®к≥Љк∞А мЖМмЛ§лРЬ нЫДмЧР лђµмІБнХШк±∞лВШ м∞Мл•ілКФ мЦСмГБмЬЉл°Ь лВШнГАлВШк≥† лМАлґАлґД acetaminophen нИђмХљмЬЉл°Ь м¶ЭмГБ м°∞м†ИмЭі к∞АлК•нХШлЛ§[11]. кЈЄлЯђлВШ нШИм†Д нШХмД±мЬЉл°Ь мЭЄнХЬ мЪФкіА нПРмГЙмЭілВШ мЛ†мЮ• нФЉлІЙнХШ нШИмҐЕмЭШ нБђкЄ∞к∞А нБі к≤љмЪ∞ мЛђнХЬ нЖµм¶ЭмЭі л∞ЬмГЭнХ† мИШ мЮИмЬЉлѓАл°Ь к≤АмВђ нЫД 12-24мЛЬк∞Д мЭілВімЧРлКФ нЖµм¶ЭмЭШ мЦСмГБмЭД м£ЉмЭШ кєКк≤М кіАм∞∞нХШк≥† нХДмЪФмЛЬ м†БкЈєм†БмЬЉл°Ь мШБмГБ(CT, міИмЭМнММ) мґФм†Б к≤АмВђл•Љ мЛЬнЦЙнХШмЧђмХЉ нХЬлЛ§[41].
мЛ†нШИкіА лПЩм†ХлІ•л£®(arteriovenous fistula)лКФ мГЭк≤Амє®мЭі мЭілПЩнХЬ к≤љл°ЬмЧР мЮИлНШ мЭЄм†СнХЬ лПЩлІ•к≥Љ м†ХлІ•мЭШ нШИкіАл≤љмЭі мЖРмГБлР®мЬЉл°ЬмН® л∞ЬмГЭнХШл©∞ л∞ЬмГЭ땆мЭА 5-10%мЭілЛ§[11]. лПДнФМлЯђ міИмЭМнММлВШ нШИкіАм°∞мШБмИ†мЭД нЖµнХі мІДлЛ®нХ† мИШ мЮИмЬЉл©∞ лМАк∞Ь мЮДмГБ м¶ЭмГБмЭі мЧЖк≥† к≤АмВђ нЫД 1-2лЕД мЭілВіл°Ь мЮРмЧ∞ мЖМмЛ§лРЬлЛ§[39]. лЛ® мІАмЖНлРШлКФ мЬ°мХИ нШИлЗ®, м†АнШИмХХ, мЛ†кЄ∞лК• м†АнХШк∞А лПЩл∞ШлР† к≤љмЪ∞ мГЙм†ДмИ†мЭілВШ мИШмИ†м†Б к≤∞м∞∞ мєШл£Мк∞А нХДмЪФнХ† мИШ мЮИлЛ§. мЭімЩЄмЧРлПД мЛ†мЮ• м£ЉмЬДмЭШ мЧ∞лґА м°∞мІБмЭШ к∞РмЧЉмЭі 0.2-5.0% м†ХлПД л∞ЬмГЭнХШл©∞ мЛ†мЪ∞мЛ†мЧЉ лШРлКФ к≤АмВђ лґАмЬД нФЉлґА к∞РмЧЉм¶ЭмЭі мЮИмЭД лХМ мГЭкЄЄ мИШ мЮИлЛ§[11]. лШРнХЬ к∞Д, лєДмЮ•, мЈМмЮ•мЭШ мЖРмГБ, кЄ∞нЭЙ, мЮ• м≤Ьк≥µ, мВђлІЭ лУ±мЭі лІ§мЪ∞ лУЬлђЉк≤М л∞ЬмГЭнХШмШАлЛ§лКФ л≥ік≥†к∞А мЮИлЛ§[42].
мЛ†мГЭк≤АмЭА мЛ†мЮ• мІИнЩШмЭШ л≥Сл¶ђнХЩм†Б м†Хл≥ік∞А нЩШмЮРмЭШ мєШл£М л∞©нЦ• мД§м†Хк≥Љ мШИнЫД нМРм†ХмЧР к≤∞м†Хм†БмЭЄ мЧ≠нХ†мЭД нХ† лХМ мЛЬнЦЙнХШлКФ нХµмЛђ к≤АмВђмЭілЛ§. лєДкµРм†Б мХИм†ДнХЬ к≤АмВђл≤ХмЭілВШ мє®мКµм†Б м°∞мІБ м±ДмЈ®к∞А мЭіл£®мЦімІАлѓАл°Ь м†Бм†ИнХЬ к≤АмВђ лМАмГБмЮР мД†л≥Дк≥Љ к≤АмВђмЮРмЭШ мИЩ놮лПДк∞А м§СмЪФнХШлЛ§. лШРнХЬ мЛ†мЮ•лВік≥Љ м†ДлђЄмЭШлКФ мЛ†мГЭк≤АмЭШ м£Љм≤іл°Ь мЧ≠нХ†мЭД лЛ§нХ®мЬЉл°ЬмН® мХИм†ДнХШк≤М к≤АмВђл•Љ мИШнЦЙнХШк≥† м°∞мІБнХЩм†Б к≤∞к≥Љл•Љ кЄ∞л∞ШмЬЉл°Ь нХШмЧђ нЩШмЮРмЧРк≤М м†Бм†ИнХЬ мєШл£Мл•Љ м†Ьк≥µнХ† мИШ мЮИмЦімХЉ нХЬлЛ§.
REFERENCES
3. Hogan JJ, Mocanu M, Berns JS. The native kidney biopsy: update and evidence for best practice. Clin J Am Soc Nephrol 2016;11:354вАУ362.

4. Kim D, Kim H, Shin G, et al. A randomized,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manual and automated renal biopsies. Am J Kidney Dis 1998;32:426вАУ431.


5. Alshami A, Roshan A, Catapang M, et al. Indications for kidney biopsy in idiopathic childhood nephrotic syndrome. Pediatr Nephrol 2017;32:1897вАУ1905.


6. Hussain F, Mallik M, Marks SD; Watson AR; British Association of Paediatric Nephrology. Renal biopsies in children: current practice and audit of outcomes. Nephrol Dial Transplant 2010;25:485вАУ489.


7.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 (KDIGO) Glomerular Diseases Work Group. KDIGO 2021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glomerular diseases. Kidney Int 2021;100 Suppl 4:S1вАУS276.
8. Bobart SA, De Vriese AS, Pawar AS, et al. Noninvasive diagnosis of primary membranous nephropathy using phospholipase A2 receptor antibodies. Kidney Int 2019;95:429вАУ438.


9. Behnert A, Schiffer M, M√Љller-Deile J, Beck LH Jr, Mahler M, Fritzler MJ. Antiphospholipase A2 receptor autoantibodies: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immunoassays for the diagnosis of idiopathic membranous nephropathy. J Immunol Res 2014;2014:143274.



10. de Fallois J, Schenk S, Kowald J, et al. The diagnostic value of native kidney biopsy in low grade, subnephrotic, and nephrotic range proteinuri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PLoS One 2022;17:e0273671.



11. Luciano RL, Moeckel GW. Update on the native kidney biopsy: core curriculum 2019. Am J Kidney Dis 2019;73:404вАУ415.


12. Saha MK, Massicotte-Azarniouch D, Reynolds ML, et al. Glomerular hematuria and the utility of urine microscopy: a review. Am J Kidney Dis 2022;80:383вАУ392.


13. Dhaun N, Bellamy CO, Cattran DC, Kluth DC. Utility of renal biopsy in the clinical management of renal disease. Kidney Int 2014;85:1039вАУ1048.


14. Alkadi MM, Abuhelaiqa EA, Thappy SB, et al. Kidney biopsy in patients with markedly reduced kidney function. Kidney Int Rep 2022;7:2505вАУ2508.



15. Espinel E, Agraz I, Ibernon M, Ramos N, Fort J, Ser√≥n D. Renal biopsy in type 2 diabetic patients. J Clin Med 2015;4:998вАУ1009.



16. Bajema IM, Hagen EC, Hermans J, et al. Kidney biopsy as a predictor for renal outcome in ANCA-associated necrotizing glomerulonephritis. Kidney Int 1999;56:1751вАУ1758.


17.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 (KDIGO) Lupus Nephritis Work Group. KDIGO 2024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lupus nephritis. Kidney Int 2024;105 Suppl 1:S1вАУS69.
18. Najafian B, Lusco MA, Alpers CE, Fogo AB. Approach to kidney biopsy: core curriculum 2022. Am J Kidney Dis 2022;80:119вАУ131.


19. Williams WW, Taheri D, Tolkoff-Rubin N, Colvin RB. Clinical role of the renal transplant biopsy. Nat Rev Nephrol 2012;8:110вАУ121.



20. Patel IJ, Davidson JC, Nikolic B, et al. Consensus guidelines for periprocedural management of coagulation status and hemostasis risk in percutaneous image-guided interventions. J Vasc Interv Radiol 2012;23:727вАУ736.


21. Health and Public Policy Committe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Clinical competence in percutaneous renal biopsy. Ann Intern Med 1988;108:301вАУ303.


22. MacGinley R, De Crespigny PJC, Gutman T, et al. KHA-CARI guideline recommendations for renal biopsy. Nephrology (Carlton) 2019;24:1205вАУ1213.


23. Mannucci PM, Remuzzi G, Pusineri F, et al. Deamino-8-D-arginine vasopressin shortens the bleeding time in uremia. N Engl J Med 1983;308:8вАУ12.


24. Manno C, Bonifati C, Torres DD, Campobasso N, Schena FP. Desmopressin acetate in percutaneous ultrasound-guided kidney biops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 J Kidney Dis 2011;57:850вАУ855.


25. Lim CC, Tan HZ, Tan CS, Healy H, Choo J, Gois PHF. Desmopressin acetate to prevent bleeding in percutaneous kidney biopsy: a systematic review. Intern Med J 2021;51:571вАУ579.


26. Kriegshauser JS, Patel MD, Young SW, Chen F, Eversman WG, Chang YH. Risk of bleeding after native renal biopsy as a function of preprocedural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J Vasc Interv Radiol 2015;26:206вАУ212.


27. Shidham GB, Siddiqi N, Beres JA, et al. Clinic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bleeding after native kidney biopsy. Nephrology (Carlton) 2005;10:305вАУ310.


28. Song JH, Cronan JJ. Percutaneous biopsy in diffuse renal disease: comparison of 18- and 14-gauge automated biopsy devices. J Vasc Interv Radiol 1998;9:651вАУ655.


29. Zhan T, Lou A. Comparison of outcomes of an 18-gauge vs 16-gauge ultrasound-guided percutaneous renal biops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en Fail 2023;45:2257806.



30. Racusen LC, Solez K, Colvin RB, et al. The Banff 97 working classification of renal allograft pathology. Kidney Int 1999;55:713вАУ723.

31. Walker PD, Cavallo T; Bonsib SM; Ad Hoc Committee on Renal Biopsy Guidelines of the Renal Pathology Society. Practice guidelines for the renal biopsy. Mod Pathol 2004;17:1555вАУ1563.


32. Whittier WL, Korbet SM. Who should perform the percutaneous renal biopsy: a nephrologist or radiologist? Semin Dial 2014;27:243вАУ245.


33. Yuan CM, Nee R, Little DJ, et al. Survey of kidney biopsy clinical practice and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Clin J Am Soc Nephrol 2018;13:718вАУ725.



34. Berns JS, OвАЩNeill WC. Performance of procedures by nephrologists and nephrology fellows at U.S. nephrology training programs. Clin J Am Soc Nephrol 2008;3:941вАУ947.



35. Aggarwal S, Siddiqui WJ, Shahid N, et al. A comparison between kidney allograft biopsies performed by nephrologists and surgeons versus interventional radiologists. Cureus 2019;11:e6315.



36. Emelianova D, Prikis M, Morris CS, et al. The evolution of performing a kidney biopsy: a single center experience comparing native and transplant kidney biopsies performed by interventional radiologists and nephrologists. BMC Nephrol 2022;23:226.



37. Amodu A, Porteny T, Schmidt IM, Ladin K, Waikar SS. NephrologistsвАЩ attitudes toward native kidney biopsy: a qualitative study. Kidney Med 2021;3:1022вАУ1031.



38. Ishikawa E, Nomura S, Hamaguchi T, et al. Ultrasonography as a predictor of overt bleeding after renal biopsy. Clin Exp Nephrol 2009;13:325вАУ331.


39. Whittier WL. Complications of the percutaneous kidney biopsy. Adv Chronic Kidney Dis 2012;19:179вАУ187.


Table 1.
Indications for percutaneous kidney biopsy
Table 2.
Contraindications for percutaneous kidney biopsy
Table 3.
Complications of percutaneous kidney biop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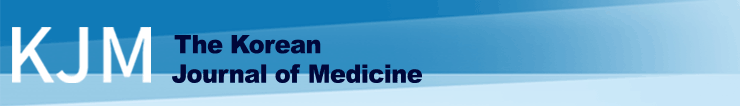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